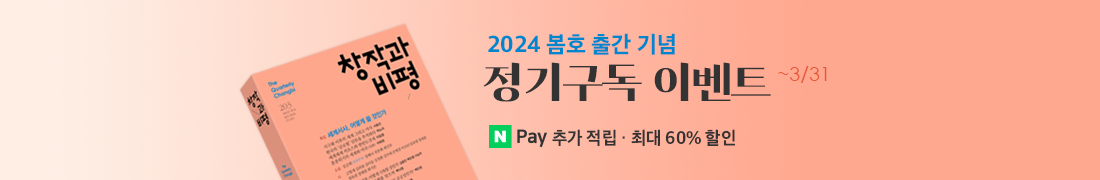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촌평
최민 『글, 최민』, 열화당 2021
이미지, 텍스트, 콘텍스트
나희덕 羅喜德
시인,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rhd66@hanmail.net

『글, 최민』은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최민이 40년 동안 쓴 산문 전체를 망라한 책이다. 독자들에게 최민은 시집 『어느날 꿈에』(창비 2005) 『상실』(문학동네 2006) 등을 펴낸 시인으로, 또는 곰브리치(E. H. J. Gombrich)의 『서양미술사』(The Story of Art, 열화당 1977)와 존 버거(John Berger)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 열화당 2012) 등의 번역자로 더 알려져 있다. 미술 이론가나 평론가로서는 단 한권의 책도 낸 적이 없다. 이 책의 발문을 쓴 열화당 이기웅 대표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각별한 인연을 회고하면서 “책을 하나의 이력으로 삼으려는 꾀,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망이 전혀 없었던 그의 성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민은 이미지 연구자로서 미술, 사진, 영화, 문학, 심지어 광고나 미디어 등 시각문화의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글을 써왔다. 그는 또한 1980년대 ‘현실과 발언’ 동인지와 『시각과 언어』라는 무크지를 통해 한국에 새로운 미술의 활로를 열고자 노력했고, 10년 동안의 프랑스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영상원장을 지내면서 문화예술계의 행사들을 기획했다. 이렇게 생애 후반부로 갈수록 연구자나 평론가보다는 교육자나 기획자로서 대외적 활동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흩어져 있던 평론과 산문을 미발표작까지 정성스럽게 갈무리해준 열화당 출판사의 우정 덕분에 우리는 최민이 글 쓰는 자로서 살아온 40년의 세월과 시대적 풍경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의 힘’ ‘미술의 쓸모’ ‘전시장 안과 밖에서’ ‘사진의 자리’ ‘영화, 시대유감’ ‘서구미술의 정신’ ‘생각의 조각’ ‘책과 사람들’, 이렇게 여덟개로 구성된 부의 제목만 보아도 그의 글이 포괄하는 영역이 장르는 물론이고 이론에서 현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넓고 다채로운지 가늠할 수 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1부 ‘이미지의 힘’에 포함된 글들이었다. 아무래도 그의 박사학위 논문 「영화가 회화에 미치는 영향: 1960~1970년대 신구상회화의 경우」(1993)와 연관된 글들이라 해박한 지식과 탁견이 돋보였다. 그는 미술과 영화, 이미지와 텍스트, 기억과 망각 등의 관계를 짚으며 이미지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미술 속의 영화, 영화 속의 미술」에서 그는 회화가 영화에 미친 영향에 비해 영화가 회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것은 영화와 회화에 부여된 사회적 지위가 다를 뿐 아니라, 시간성의 예술인 영화와 공간성의 예술인 회화는 물질적 기반과 존재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순수시각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영화 이미지의 비물질적이고 유동적인 속성과 달리 회화의 이미지는 물질로서의 구체적인 두께와 무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네오다다(Neo-Dada)와 팝아트, 프랑스의 신구상회화의 일부 작가들은 영화 이미지의 ‘비물질적인’ 속성을 그들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려 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 화가들이 커다란 화폭에 담긴 충격적인 이미지로 대항하려고 한 것은 영화나 텔레비전의 거대한 스크린을 의식하거나 그와 경쟁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척 클로스(Chuck Close)같은 극사실주의 화가를 비롯해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등의 작가들이 클로즈업된 인체나 스펙터클한 풍경을 즐겨 그리는 것에도 영화의 영향이 각인되어 있다. 이미지의 크기뿐 아니라 시점의 이동과 변화, 단일성과 복수성의 면에서도 회화는 영화적 기법을 차용했다. ‘서술적 구상’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화면을 분할하거나 몽타주를 활용한 신구상회화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자크 모노리 회화의 영화적 효과」는 그 구체적 사례를 자세히 분석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저공비행, 활강, 그리고 놀이」는 에르베 뗄레마끄(Hervé Télémaque)의 유화 한장에서 시작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다룬 글이다. “이미지는 기호가 아닌 척하는 기호”라거나 “시와 회화는 다툰다. 왜냐하면 그 둘 다 동일한 영토(지시, 재현, 외연, 의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미첼(W. J. T. Mitchell)의 말처럼 언어와 이미지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지만, 이는 오히려 언어와 이미지의 유사성과 치환 가능성을 방증한다. “언어가 개입하면 지각적 체험의 내용 자체가 바뀐다. 언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말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이처럼 그의 학문적 관심은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있는 다양한 해석 과정과 수사학적 효과, 콘텍스트의 이동에 있었던 듯하다.
이쯤에 이르면 최민이 미술 전공자로서 왜 시를 썼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시가 문화와 예술의 핵심이자 근본”이라고 말한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라는 글에서 천상병의 「주막에서」를 소박한 언어로 절묘한 이미지를 구현해 보여준 시라고 극찬했다. 서구적 모더니티를 기반으로 한 시각문화 연구자로서는 다소 뜻밖의 취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시집들을 읽어보아도 우울과 불안을 기조로 한 감상적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시에서는 미술 분야의 공적 역할이나 이론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페르소나를 꺼내 보인다. “‘나’라고 하는 일상적인 개별적 자아와 ‘역사’라는 전체적 삶과의 틈바구니에서”(「소시민의식의 극복」) 갈등을 겪으며 그 모순과 분열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를 쓰는 일은 그에게 해방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는 번역작업에도 공력을 쏟았다. 특히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몇개의 판본으로 번역된 적이 있지만 최민의 번역을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 ‘Ways of Seeing’이라는 원제의 복수형을 그는 ‘다른’이라는 말로 살려내었다. 예술을 보는 단일한 표준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존 버거뿐 아니라 최민이 줄곧 견지해온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이나 제도 안에 갇힌 강단 미술사에서 벗어나 다른 삶의 영역을 넘나들며 “미술사의 논의에서 흔히 배제했거나 또는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급, 인종, 성차의 문제, 그리고 작품의 소유나 후원에 연관된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과 발언’ 동인이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부 ‘미술의 쓸모’에 수록된 글들은 당시 화단에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듯하고, 3부 ‘전시장 안과 밖에서’는 민정기 신학철 강요배 여운 황세준 심정수 등의 작가론이나 작품론으로서 동시대의 작가들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담고 있다. 사진과 영화에 대한 현장 비평인 4부와 5부에 이어 6부 ‘서구미술의 정신’은 『서양미술사』의 최초 번역자답게 서양미술사의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들려준다. 문화와 문학에 대한 자유로운 단상들이 펼쳐지는 7, 8부를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이미지, 이미지와 텍스트, 이론과 현장을 오가며 새로운 관점과 수많은 콘텍스트를 만들어낸 최민의 드넓은 궤적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가 글로 써내려간 40년의 발자취를, 860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이 짧은 글에 일일이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