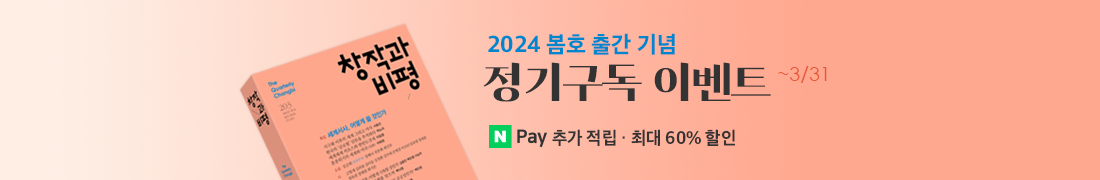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촌평
정은정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한티재 2021
밥이 온다, 사람이 온다
명인 命人
인권교육연구소 ‘너머’ 소장 leftturtle@gmail.com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지만 유령처럼 비가시화된 노동에 관한 이야기다. 이반 일리치(Ivan Illich)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돈 주고 사야만 쓸 수 있게 만든 체제가 자본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력을 팔아 그것들을 산다. 그런 체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식재료는 ‘상품’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소비자’다. 그리고 소비자의 유일한 관심사는 상품의 ‘질과 가격’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의 관심은 집요하게 ‘사람’이다. 먹는 사람, 먹이는 사람. 그리고 저자에게 그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는 ‘농담 같은 지옥’이다.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시선은 한없이 따뜻하고, 지옥도를 파헤치는 그의 분석은 깊고 날카롭다.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다보면 때로 가슴이 시리고, 때로 울컥하다가, 문득 내 시선에 내가 찔린다.
우선 저자에게 음식은 ‘먹는 사람’이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빌려 평자 나름대로 이 책의 몇몇 대목을 다시 써보자면 이렇다. 음식이 온다. 음식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누군가가 먹거나 먹지 못한 음식으로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온다. 매일 혼자 밥을 먹을 어린 딸에게 마른 밥상을 차려놓고, 대충 물에 만 밥을 후루룩 한술 뜨고 서둘러 출근하는 봉제공장 노동자 엄마가 온다(‘책을 펴내며’). 자기 방은커녕 책상 하나 없어 식탁에서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일도 하는 이 땅의 흔하디흔한 여성들이 어느날 문득, 책과 노트북이 널브러진 식탁에서 분리한 식사의 존엄은 양은밥상에 실려 온다(후기 「‘남양주지옥분식 통신’」). 연료비까지 포함하여 한끼 1,540원의 식사도 황제 식단이라고 비난받는 소년들이 오고(「소년원의 급식도 학교급식이다」), 한끼에 얼마짜리를 먹을지 온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식아동들이 오고(「소년의 차가운 밥상」), 믹스커피 한잔으로 때우던 점심마저 잃어버린 폐지 줍는 노인들이 온다(「황혼의 밥상」). 3천원에 억지로 ‘와꾸’를 맞춘 기숙사 밥에 질려 굶거나 바나나맛 우유로 한끼를 때우는 청년들이 오고(「청춘들의 삼시 세끼 보고서」), 2인 1조 노동의 안전규칙마저 지키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미처 먹지 못한 가방 속의 컵라면으로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온다(「김 군의 숟가락」)…… 음식이 온다는 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어쩌면 그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살필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저자에게 음식은 ‘먹이는 사람’이다. 마트에서 가지런히 썰려 팩에 포장된 돼지고기로는 절대 떠올리지 못할 사람, 사람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깔끔하게 다듬어진 식재료가 우리 집 부엌으로 오기까진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야 하는지. 아무리 죽여도 퍼지는 지긋지긋한 풀과 벌레, 결국 농사란 살리는 일이 반이면 죽이는 일이 반이라는 걸. 쌀값이 세배 오른 40년 동안 아파트값은 84배가 오른 세상에서 맹독성 농약을 치는 농민들이 우비라도 입었는지 걱정하는 저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호들갑을 떠는 우리에게 묻는다. ‘배춧값이 정말 무서운가?’ 하고. 축산이라고 다를까? 소든 돼지든 닭이든 키우고 살을 찌워 죽여야 고기가 된다. 거기에 광우병이나 돼지열병, 조류독감이라도 돈다면? 저자는 또 묻는다. 시시때때로 몇백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고, 동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작 그것을 ‘기르고 죽이는 이들의 곡소리’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에서 정작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이주노동자들인지는 아느냐고. 아무것도 ‘죽여본 적 없는’ 우리에게 말이다.
셋째, 저자에게 먹이는 사람들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노동자도 먹이는 사람이고, 김밥집이나 치킨집,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먹이는 사람이다. 떡볶이를 배달하는 청년도, 집집마다 신선식품을 나르는 택배노동자도, 우리가 한여름 시원한 마트에서 쾌적하게 장을 볼 때 에어컨 냉매를 주입하던 노동자도,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노동자도 먹이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해 보이는 노동마저 우리를 먹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사회학은 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과 비정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웃음과 한숨, 눈물과 고통, 포만감과 허기, 생존과 영혼의 소외,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발굴하듯 캐내어 비추고 있다.
저자의 ‘페이스북’부터 출간한 모든 책에 이르기까지 애독자인 나에게도 한가지 아쉬움은 있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했듯 우리의 밥상은 온갖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얽혀 있는 장이다. 이 밥상의 정치학엔 한 가족 내에서 누가 밥을 짓고, 누가 먹느냐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런데 글에서 드러나는 그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어른’이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다 큰 자식들에게 반드시 밥을 차려주고 일을 나가야 하는 ‘어른’이고, 존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물론, 일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청년이 어엿한 성인이어도 그를 ‘황승원 군’이라고 언명하는 ‘어른’이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저자의 보호주의적 시각이 ‘엄마’와 ‘어른’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따뜻한 밥 한끼를 내가 가진 가장 예쁜 그릇에 곱게 차려 저자와 같이 먹고 싶다. 나의 정성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자의 유쾌한 농담으로 차려진 식탁이, 조금은 시렸던 우리의 유년을 위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어린 시절의 윗목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어른이나 책임감에 짓눌린 어른이 아니라, 나이 어린 이들과도 서로 돌보는 ‘동료 시민’으로,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란히’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