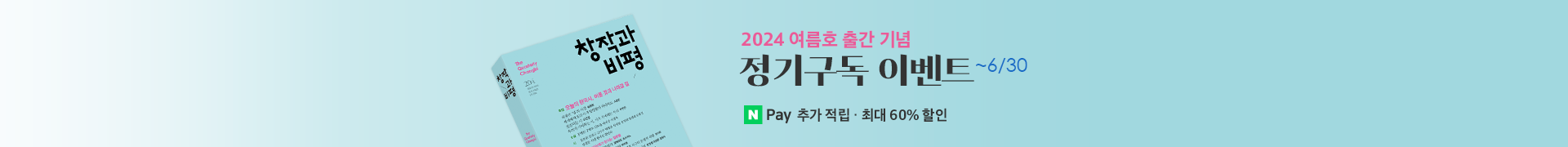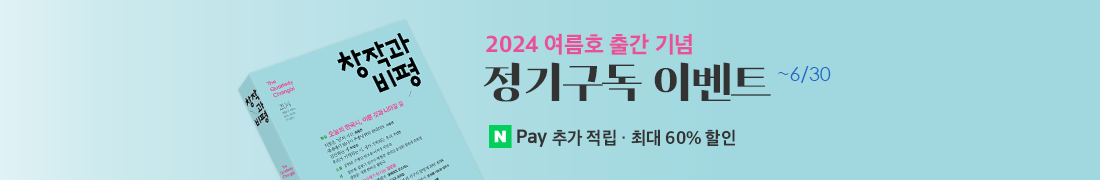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촌평
에카 쿠르니아완 『호랑이 남자』, 오월의봄 2018
흔들리는 살부(殺父)의 욕망
인아영 印雅瑛
문학평론가 itwontdo@gmail.com

아마도 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에카 쿠르니아완(Eka Kurniawan)이라는 인도네시아 작가의 이름은 생소할 것이다. 1975년생인 그는 『상상의 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을 통해 처음 영어권에 소개되었고, 2016년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오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작년 말 한국에도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오월의봄 2017)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호랑이 남자』(박소현 옮김)는 쿠르니아완이 2004년에 발표한 두번째 장편소설로, 아름다운 문체와 팽팽한 긴장감을 지닌 범죄소설이자 인도네시아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담아낸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분히 그런 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다. 외부의 반응은 잠시 괄호 쳐두고 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직접 대면해보자.
“마르지오가 안와르 사닷을 죽이던 해질녘, 키야이 자로는 제 양어장에서 아끼는 물고기를 돌보고 있었다.”(21면) 인도양 연안의 도시에서 한 청년이 이웃 아저씨를 살해한 이야기를 담은 『호랑이 남자』는 이 첫 문장에서 이미 범인인 마르지오의 이름을 밝힌다. 이로써 소설을 추동하는 질문은 ‘누가 죽였느냐’가 아니라 ‘왜 죽였느냐’가 되는 셈이다. 동네의 또래 중에서 가장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청년인 마르지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중년 남성 안와르 사닷을 왜 죽였을까? 아무리 그가 모작을 일삼는 형편없는 화가인데다가 부인을 두고도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주목할 점은 마르지오가 안와르 사닷을 죽인 방법이다. 마르지오는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어 죽였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 기괴한 상황은, 산골마을의 사내들이 여러 대를 거쳐 암호랑이를 물려받게 된다는 인도네시아의 구전설화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안와르 사닷의 목에 이빨을 꽂아 넣고 물어뜯어 죽인 것은 마르지오의 몸속으로 들어간 하얀 암호랑이인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호랑이 남자』에 대한 해외의 찬사를 괄호 바깥으로 꺼내어본다면, 왜 이 소설이 인도네시아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독자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굳이 보르헤스나 가르시아 마르께스를 경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제3세계’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소설이라고 해서 구태여 한데 묶여 감상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1 물론 아름답고 풍부한 문체, 박진감 넘치는 짜릿한 서스펜스, 환상적으로 변용한 인도네시아 전통이라는 수식어라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을 아름다움과 환상성이라는 단어로 버무리는 대신, 그리고 발문을 쓴 베네딕트 앤더슨의 해석에 기대는 대신, 이러한 범죄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쿠르니아완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직접 다가가보는 것은 어떨까?
『호랑이 남자』와 관련하여 부자(父子)관계나 세대론을 언급한 리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밀도 높게 차 있는 정념은 아버지에 대한 마르지오의 살인충동이기 때문이다. 마르지오는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면서 생계에는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마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면 천 개의 머리와 천 개의 손을 가진 브라할라 거인으로 변해 불을 뿜는”(77면) 크리슈나가 된 듯 엄청난 혐오와 분노를 느낀다. 게다가 스무살이 되자, 쇠약해진 쉰살의 아버지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 인간을 죽이고 말 거”(83면)라는 다짐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는 결국 병에 걸려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누가 봐도 너무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97면)을 보이기까지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아버지를 둔 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면 한국 독자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지오의 분노는 곧장 아버지의 목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웃 아저씨인 안와르 사닷의 목으로 향한다. 살부(殺父)의 욕망이 우여곡절을 넘고 여러 인물의 사연을 에둘러가는 동안, 우리는 두 집안 사이에 2대째 벌어지는 치정의 역사를,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목도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쿠르니아완의 묘사가 남성 작가의 상상의 소산이라는 점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인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적인 추행에도 여성이 결국 희열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묘사한 점도 무심코 지나치기는 어렵다. 다만 집 안 곳곳에 알라만다, 방울꽃, 천일홍, 란타나, 나리꽃 등 온갖 꽃을 아무렇게나 심어두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집만이라도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한 여성의 깊은 광기와 절망의 이미지는 곱씹어볼 만하다.
한편 마르지오가 아버지를 건너뛴 채 할아버지로부터 곧장 암호랑이를 물려받는다는 설정은 작가의 세대론적인 감각에 주목하게 한다. 정글에서 활개 치는 게릴라들마저 몰아낼 만큼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한다는 암호랑이가 결국 윗세대인 안와르 사닷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어쩌면 전설과 미신의 세계인 “싸구려 인도네시아 소설”과 대학에서 공부한 서양철학 및 “문학사의 위대한 걸작들”(한국어판 저자 서문) 사이에서 충돌해왔다는 작가 자신의 흔들리는 세대적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도네시아 문학을 거의 읽지 않았다면서도 그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비판한 인도네시아의 대작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Pramoedya Ananta Toer를 중심으로 대학졸업논문을 쓴 바 있다.)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마르지오의 선택에 끝내 먹먹해지는 독자라면, 그 불가피한 선택으로 치닫는 이 소설을 단순히 서스펜스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수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 그러나 작가 자신은 라틴아메리카 작가와의 비교가 “책 홍보에는 좋은 역할을 할 테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작가로서 자신의 전략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아름다움 그것은 상처, 그 한마디에 조국 비극 담았죠”」, 한겨레 2018.3.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