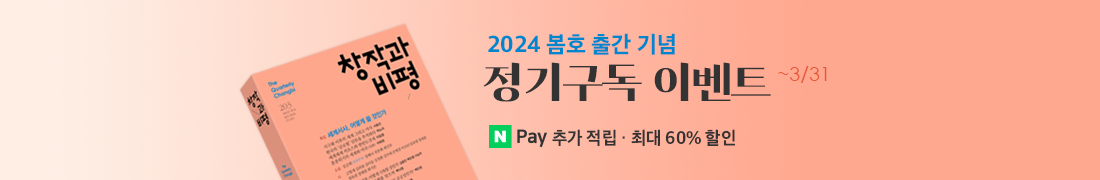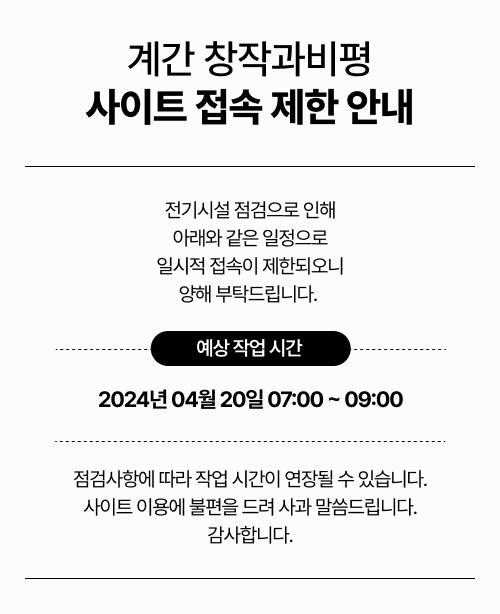창비주간논평
운디드니에서 스탠딩락으로: 디 브라운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원주민의 역사에 대한 책을 하나 고르겠다고 하고서 처음 떠올린 책이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디 브라운 지음,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이하 『운디드니』)이긴 했다.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적 책인가.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도 괜찮으니 필요한 책을 골라 소개한다는 게 <잔다리서가>의 취지라고는 하나 원서가 처음 발간된 게 1970년이니 오래되어도 너무 오래되긴 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시점도 아마 198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다. 내 기억 속의 『운디드니』는 창작과비평사에서 나온 제3세계 문학선 은구기 와 시옹고의 『피의 꽃잎』, 황 춘명의 『사요나라, 짜이젠』과 함께 묶여 있다. 후자의 책들이 발간된 게 1983년이었으니 『운디드니』를 처음 접한 것도 그 무렵이었던 듯하다. 당시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던 「초원의 집」이 그려내는 서부개척사에 익숙했던 중고생에게 결국 모두가 죽고 마는 운디드니의 전투나 케냐와 대만의 생생한 현실과 저항의 목소리를 담은 소설들이 남긴 인상은 너무도 강렬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인디언 기록문학’이라고 알려진 『운디드니』의 한국어 번역본은 총 다섯번 출간되었다. 1979년 청년사에서 처음 나왔고 프레스하우스(1996), 나무심는사람(2002), 한겨레출판(2011)을 거쳐 2016년에 길 출판사에서 마지막으로 재출간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절판 상태다. ‘내 심장을 운디드 니에 묻어다오’(2007)라는 제목으로 영화화가 되어 국내에서 DVD도 출시된 바가 있다.
『운디드니』는 ‘미국 인디언 멸망사’라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디언들이 백인들과 만나면서 우호, 적대, 협약, 전투, 투항 등 다양한 대응을 취해봤지만 어떤 길을 택하든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책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간은 1860년에서 1890년에 이르는 30년간이다. 18세기 후반 미국이 독립할 무렵 이미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사라진 상태였다. 1834년 미국의회는 미시시피강 서쪽은 영구히 원주민들의 땅으로 인정한다면서 평화조약의 이름을 빌려 동쪽의 원주민들에게 강제 이주를 종용했다. 그러나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본격화된 백인들의 서부 이주 열풍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1869년에는 대륙횡단열차가 개통되었고 금을 탐사하기 위해 달려가는 백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들어가고 그 군대를 따라 땅을 얻으려는 백인들이 이주했다.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는 백인들로 인해 원주민들과 충돌이 생길 때마다 군대는 원주민들을 학살했다. 전설적인 지도자들조차 차례로 희생되면서 각 부족은 모두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살아남은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주거지역 안으로 이주해 들어갔다. 책의 마지막은 쑤우족의 지도자 큰발(Big Foot)과 일행들이 운디드니에서 최후를 맞는 장면으로 끝난다. “1890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찢기고 피 흘리는 부상자들이 촛불 켜진 예배당에 옮겨졌을 때 아직 의식을 잃지 않은 인디언들은 서까래에 늘어뜨려 장식한 크리스마스트리를 볼 수 있었다. 설교단 뒤 합창대석 위에는 엉성한 글씨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땅에는 평화, 사람에겐 자비를.”(나무심는사람, 695면) 백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명절에 부여한 ‘땅에는 평화, 사람에겐 자비’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면서 책은 마무리된다.
『운디드니』는 여전히 미국 토착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절판되기는 했어도 여러번 출간되다보니 도서관에도 있고 중고책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러니 미국 원주민 관련 책을 고르면서 선뜻 이 책으로 정하지 못하고 망설인 이유가 단지 절판 도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선 1970년 이후 원주민의 역사가 너무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고 ‘멸망사’라는 부제가 미국 원주민들이 진짜 망해 없어졌거나 아니면 계속 몰락의 길만 겪고 있는 낙후된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무지를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절판되지 않은 유사한 주제의 책으로 햄프턴 사이즈의 『피와 천둥의 시대』(홍한별 옮김, 갈라파고스 2009)가 있지만 그 책을 고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 역시 ‘미국의 서부 정복과 아메리칸 인디언 멸망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하지만 1970년에 나온 책이라면 모를까, 2006년 출간된 원서가 여전히 미국언론에서도 ‘미국 서부 개척사의 잔혹한 이면’을 다뤘다며 찬사를 받는 상황은 미국 정착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 원주민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많은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고 활발하게 전개된 원주민 정치에서 비롯한 토착연구가 비판적 미국학을 주도하고 있지만, 학계와 사회운동 일부를 넘어 미국사회 일반의 시각은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운디드니』를 고른 이유는 우선 운디드니라는 지명이 가지는 상징성에 있다. 1890년 400여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학살되면서 원주민 수난의 상징이 된 운디드니에서는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2023년 2월 27일은 오글라라 라코타 부족과 미국인디언운동(AIM) 회원들이 사우스다코타주의 운디드니 언덕을 점거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73년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71일간 200여명의 오글라라 라코타들은 부족의회와 연방정부의 부패, 공동체를 위협하는 추장의 폭력, 잇단 인종차별적 범죄행위에 저항하는 투쟁을 감행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병력과 저격수를 투입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식량을 포함한 보급품의 전달을 막았음에도 두달 넘게 이어진 그들의 저항은 미국 원주민운동의 새로운 국면, 즉 ‘레드 파워’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디드니 지역의 역사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권리를 찾아 투쟁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해서 무력하게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973년의 투쟁은 원주민들이 절대 멸망하지 않았으며, 동시대인으로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운동은 오랜 조직화와 준비과정을 거친 것이었고, 막연하게 곤궁을 호소하는 것도 그렇다고 백인들과의 공존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1868년 원주민들과 연방정부 사이에 맺어진 포트래러미조약을 더는 위반하지 말라는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었다. 이 조약이 그들에게 특히 중요했던 것은 1850년대에 맺어진 조약이 거듭 침해되는 상황에서 직접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많은 원주민이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포트래러미조약 이후에도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보호구역 내에 수용하는 폭력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저항도 이어졌다. 운디드니 점거는 부패한 원주민 지도자들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동시에 띠었고, 이에 따라 청년들과 여성들의 참여가 유독 두드러졌다. 그 투쟁의 기억은 다시 2016년 운디드니에서 멀지 않은 사우스다코타 스탠딩락에서 벌어진 송유관 반대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운디드니 점거 참여자 중 일부가 직접 가담하여 원주민운동의 끊이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한편 원주민들이 멸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서 싸우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이들을 싸우게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남의 이야기처럼 원주민 권리를 인정하자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들의 투쟁을 외면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다. 거꾸로 더는 자신들을 무시하면서 자원을 채굴하지 말라는 이들의 소리가 현대 한국인의 삶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1850년대에 원주민들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게 만든 것은 조약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금맥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구리와 우라늄 광산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송유관 건설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채굴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에 저항하는 투쟁은 21세기의 오늘에도 현재진행형이다.
* 이 글은 세교연구소의 서평웹진 <잔다리서가>에 소개된 서평입니다.
백영경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2024.4.23. ⓒ창비주간논평·잔다리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