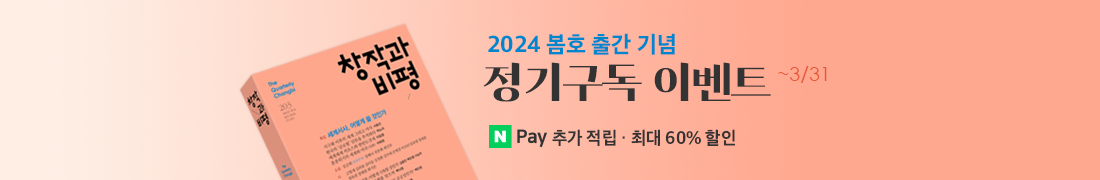창비주간논평
에밀리에게는 장미를

황정아
대체로 이맘때가 되면 한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쉽고 못다 한 일을 두고 마음이 초조해지곤 한다. 2014년은 특별히 새겨 마땅하고, 그런 의미에서 달력이 바뀐다고 그저 지나가버리는 또 한번의 일년일 수 없으므로, 끝내야 하는 일과 끝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유난히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나라인가’를 거듭 한탄하게 했고 그 모든 한탄에도 변화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이 ‘나라’를 십자가인 양 꾸역꾸역 짊어지고 갈 나날들을 생각할 때 거꾸로 매달아도 앞으로 가주는 시간이 다행인가도 싶다.
짐짓 상투적인 비유지만 ‘공동체가 짊어진 십자가’라는 구도는 문학작품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 가운데 민폐라는 통속적 의미부터 어떤 은밀한 죄의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가 함축할 수 있는 여러 층위를 고루 지시하는 예로 떠오르는 작품이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소설 「에밀리에게 장미를」(1930)이다. 기획된 공동체로 출발한 국가였기 때문인지 미국의 빼어난 소설작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조명한 사례가 많은데, 포크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미국 ‘남부’ 사회를 의식적이고 집요하게 파헤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쇠락한 ‘전통’을 짊어진 사람들
「에밀리에게 장미를」(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창비세계문학 미국편 『필경사 바틀비』, 한기욱 엮고 옮김, 창비 2010) 역시 에밀리 그리어슨이라는 한 여성의 이력을 통해 남부 공동체의 역사와 곤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남북전쟁 이전에 이른바 귀족으로 위세를 누렸으나 이제는 몰락한 가문의 자손인 이 인물의 특성은 “쇠락한 모습을 완강하고 요염하게 쳐들고 있어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309면)라는 그리어슨 가(家) 저택에 대한 묘사에 잘 응축되어 있다. 시대적 변화를 일체 접수하지 않은 채 “그리어슨 가의 마지막 후예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엄함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는”(317면) 뻣뻣한 에밀리가 엉뚱하게도 남부인의 눈에 북부 출신의 뜨내기에 불과한데다 심지어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318면)고 말한, 요컨대 매우 부적절한 상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
십자가 비유와 관련되는 지점은 일종의 ‘기념비’로서의 에밀리를 지켜보며 사건을 서술하는 복수형 화자 ‘우리 마을 사람들’의 태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에밀리는 “하나의 전통이자 의무이자 걱정거리”(310면), 한마디로 난감한 존재다. 이 난감함을 간단히 처리해보려는 ‘우리’의 시도가 도무지 소통 불가능한 에밀리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 이 단편의 묘미라 해도 좋겠다. 에밀리를 측은히 여기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은 그녀의 오만함에 가차 없이 무시당하며 에밀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역시 독극물이 동원된 엽기행각에 간단히 배반당한다(자세한 줄거리는 스포일러가 될 것이니 생략하겠다).
미국 남부의 ‘귀족’이 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쩔쩔매는 것일까. 그들이 고대에나 기록될 노예제를 가장 반인간적인 방식으로 소환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에 걸맞게 스스로 ‘귀족’으로 자임한 특별히 퇴행적인 집단이었음을 감안할 때, 마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언뜻 납득하기 힘든 면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공동체의 엄연한 일원인 흑인들은 분명 빠져 있는) ‘마을 사람들’은 노예제라는 ‘원죄’와 그로부터 꼬이고 뒤틀려온 남부 공동체의 역사에 어쩔 수 없이 연루되어 있었기에 자신들의 치부이자 상처가 된 ‘전통’을 가볍게 떨쳐낼 수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녀에게 장미를 바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에밀리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착잡함에는 그녀가 전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 희생자기도 했다는 사실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말채찍을 틀어쥐고 두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314면) 이미지로 각인된 그녀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에밀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결혼의 기회를 봉쇄했다.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부인하며 시신을 내놓지 않는 에밀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그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315면) 이해해주는 것이다. 상류층이 마을의 수치로 비난한 에밀리의 로맨스에 마을 사람들이 일말의 성원을 보낸 것도, 끝내 좌절된 그 로맨스에 한송이 ‘장미를’ 바친 제목의 취지도 그런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역사를 놓고 가정을 하는 일은 어리석다고들 하지만, 어차피 허구를 표방한 소설을 두고서라면 가정이 그리 큰 어리석음은 아닐 것이다. 에밀리 가문에 버금가는 어느 ‘귀족’ 가문이 마땅히 걸어야 할 쇠락의 뒤안길을 용케 피해 승승장구했다면, 그 가문의 후예인 가령 ‘에그밀리’라는 인물은 달랑 낡은 집 한채 물려받은 에밀리와 달리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세습하여 여전히 이 공동체의 중심이라면, 그리하여 다른 의미의 난감한 존재로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는가? 장차 어느 작가가 이 가상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할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에그밀라’에게 바치는 측은지심은 감정의 헤픔이고 장미 한송이는 미학적 테러일 것이다.
황정아 / 문학평론가, 한림대 한림과학원 HK교수
2014.12.17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