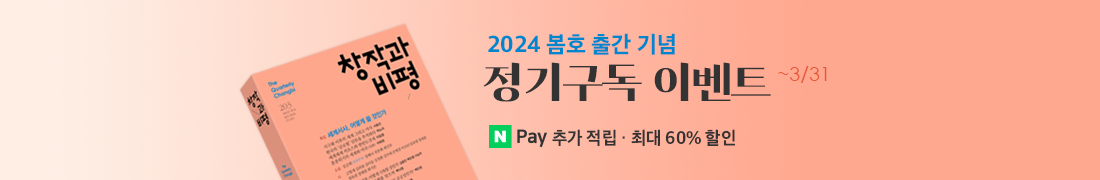창비주간논평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간직한다: 유병록 『안간힘』

박연준
슬픔은 뜨거운 것이라서 포장하려 하면 포장지가 들러붙는다. 보기 좋게 세공하려 하면 내용물이 터져 나온다. 슬픔을 두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슬픔은 원래의 모양과 열기, 에너지를 잃는다.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쭉정이처럼 가느다래진 슬픔의 그림자밖에 없다. 그렇다면 슬픔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생긴 모습 그대로, 들고 있던 형태 그대로 이쪽을 향해 내려두기. 그냥 ‘두는 일’이 최선이다. ‘두는 일’이란 슬픔을 ‘보이는 일’이다.
『안간힘』(미디어창비 2019)은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한 인간이 거기서 헤오나오려고 쓴 책이 아니다. 슬픔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슬픔을 슬픔으로 간직하기 위해 씌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슬픔을 극복할 수 없다. 슬픔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책 제목을 ‘안간힘’이라고 정하기까지, 이 무겁고 투박한 단어를 돌멩이처럼 표지에 얹어두기까지, 그는 슬픔을 지극하게 마주하고 겪어냈을 것이다.
“슬픔은 얼른 벗어나야 할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기분은, 특히나 슬픔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물러선다.”(59면)
이 책에는 ‘울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온다. 울었다. 울부짖었다.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이가 부재하는 “슬픔의 흔적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슬픔을 꼬리처럼 달고 생활하는 일일 것이다.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고, 아내와 작은 일로 다투고, 화해를 도모하면서도 그는 틈틈이 운다.
“울음은, 화산처럼 폭발하는 울음은, 마음에 담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꺼번에 날려버린다. 아무래도 울음은 무엇으로 대체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울음이 필요하다면, 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49면)
눈물을 애써 거두지 않은 채 하는 말간 고백에 책을 읽는 내내 울었다. 훌쩍이다 뚝뚝 눈물을 떨구고, 코를 풀고, 다시 울고, 자꾸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두며 ‘같이’ 울었다. 울면서 안도했다. 그가 ‘울었다’고 솔직히 적어서, 슬픔을 밖으로 꺼내주어서, 나도 따라 울 수 있어서 안도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슬픔으로 똘똘 뭉친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울다가 웃다가를 자주 반복했는데, 그가 슬픈 와중에도 “정말 괜찮을까, 대머리가 되어도?”(138면)라고 진지하게 자문하거나 아내에게 서운한 점을 따져가며 억울해하는 대목에선 웃음이 터졌다.
나는 이런 책에 사족을 못 쓴다. 웃음과 눈물에 솔직한 책. 외투가 없는 책. 마음이 외투인 책. “어떤 침묵은 외면이겠지만, 어떤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다”(37면)는 문장 앞에서 침묵의 갈피를 헤아리게 하는 책.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글로 남기는 것”(53면)이라고, 자기 슬픔을 투명하게 까 보여주는 책.
사실 겁이 났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지날 때까지,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 시간만 보냈다. 묵직한 이불을 한채 사서 집으로 보낼까, 생각하다 관뒀다. 웬 이불이람. 무거운 이불이 그를 질식하게 할 것 같았다. 오래 지난 뒤 그에게 겨우 메일을 한통 썼는데, 어느 매체에 쓴 그의 글을 읽고 나서다. “위로를 찾아 걸어오는 사람인 병록 씨를 만났는데, 왜 내가 위로를 받은 느낌인지. 왜 내가 울고 싶은지. 괜찮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겠죠?” 나는 물었고, 그는 답장을 보내왔다. “다른 사람이 모두 제 슬픔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제 이야기를 아직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오래 생각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간직할 수 있다. 이미 내 안에 받아들인 슬픔은 몸속에서 내 슬픔과 같이 살기 때문에, “아직 간직”하고 있는 슬픔이 된다. 슬픔은 돌연 발현되기도 하고 침잠해 묵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간직된 슬픔이다. 타인의 기쁨보다 슬픔이 우리 안으로 쉽게 들어온다면, 그건 우리가 가진 슬픔의 방이 광장처럼 넓기 때문일까? 타인의 슬픔을 다 알 순 없겠지만 나는 내 슬픔의 방 한편에 그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다 자라지 못한 그의 아이를 간직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눈물을 흘린 까닭은 내 안에 그의 방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작은 책을, ‘안간힘’이라는 세 글자를, 짐승처럼 울부짖는 존재를, 사랑하는 이를 이해하려는 몸짓을, 그 더듬거림을, 떠난 사람들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슬픔을 사랑한다. 슬픔에 울부짖는 사람, 그 소리를 사랑한다. 큰 슬픔 앞에선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듣는 것,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위로다.
슬픔을 꺼내 보이는 모든 시도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 ‘엄숙’을 위한 게 아니라, ‘간직’을 위해서. 당신의 슬픔을 제가 간직하겠어요, 하는 약속으로.
오랜만에 펑펑 울고 나니 맑아졌다.
박연준 / 시인
2019.11.27.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