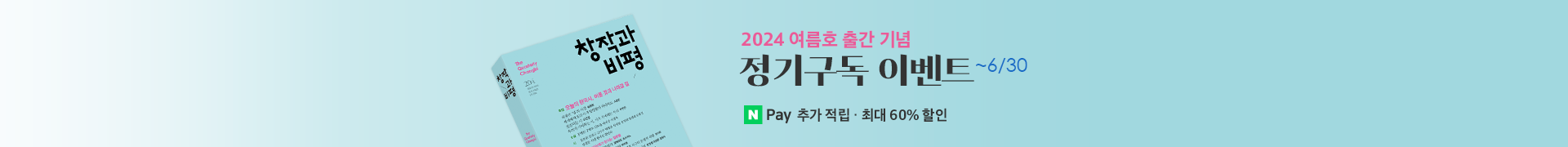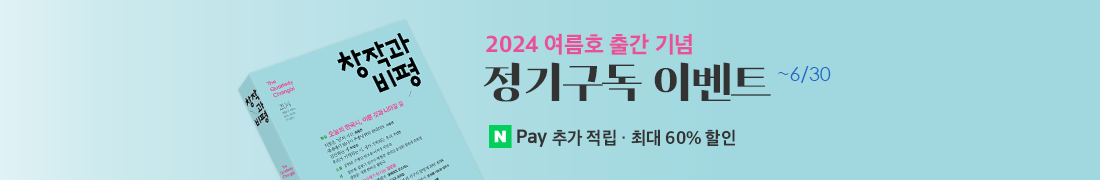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학초점
체제의 폭력과 비체제적 상상력
오창은 평론집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이선우 李宣旴
문학평론가. 주요 평론으로 「월경의 상상력과 타자의 윤리」 「청춘의 종언과 선언 사이」 등이 있음. damdam328@naver.com
 바디우(A. Badiou)는 모든 진정한 사유란 “국가의 터무니없는 과잉을 끝내기 위한 욕망”(『존재와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창은(吳昶銀)의 두번째 평론집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실천문학사 2011)에는 바로 이러한 욕망이 결연하게 드러난다. 19편의 글이 총 4부로 나뉘어 묶여 있으나, 모두 ‘체제 폭력과 약소자’라는 주제 아래 전개되고 있어 평론집으로서는 드물게 전체를 통독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작품 안으로만 매몰되지 않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당대 현실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들은 그의 비평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덕목이다.
바디우(A. Badiou)는 모든 진정한 사유란 “국가의 터무니없는 과잉을 끝내기 위한 욕망”(『존재와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창은(吳昶銀)의 두번째 평론집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실천문학사 2011)에는 바로 이러한 욕망이 결연하게 드러난다. 19편의 글이 총 4부로 나뉘어 묶여 있으나, 모두 ‘체제 폭력과 약소자’라는 주제 아래 전개되고 있어 평론집으로서는 드물게 전체를 통독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작품 안으로만 매몰되지 않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당대 현실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들은 그의 비평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덕목이다.
체제 비판이나 문학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유는 오창은 평론만이 갖는 독특함은 아니지만 그가 『비평의 모험』(실천문학사 2005)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준 이러한 비판과 사유가 ‘공감의 상상력’을 요청하는 ‘약소자 문학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적대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 안과 밖의 이분법에 고착되지 않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까지 함께 사유한다. 하여 그가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약소자’는 체제에 의해 모욕당한 자들이지만 단순히 권력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체제의 바깥에서 체제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되 권력을 욕망하지 않으며 능동적으로 체제 바깥을 상상하고 연대하는 ‘윤리적인 주체’로 ‘약소자’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약소자론은 비록 현실태보다는 지향태에 가깝긴 하지만 소수자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임에 분명하다.
대안을 요청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의 비평은 매우 윤리적이다. 체제 폭력을 비판하고 분단현실을 고민하는가 하면, 세계화시대에서 식민지시대까지 숱한 작가들의 작품을 넘나들며 체제에 의해 ‘모욕당한 자들’의 삶을 읽어가면서도, 그의 비평은 결코 절망적인 결론으로 치닫지 않는다. 그의 문학관에는 기본적으로 ‘유토피아적 지향’이 내장되어 있거니와, 그에게 비평은 단순히 개별 작품의 해석에만 머물거나 거창하게 세계 전체의 담론화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문학과 삶이 함께, 매순간 한걸음씩 나아가는 실천의 장이다.
그에 의하면 문학 또한 체제의 약소자이므로 그는 문학이 언어적 상상력으로 독자들과 인문학적 대화를 모색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상상적 연대를 형상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이런 신념은 매우 확고해서 그는 이런 가능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평론가에게 이것은 매우 소중한 작업이지만, 그의 이런 작업이 대부분 주제비평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은 아쉽다. 그는 문학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성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길게 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에도 ‘무엇’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단어를 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약소자에 대한 연민만으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58면)고 비판하다가도 “경계를 넘어설 각오가 되어 있는 연민은 분열적일지언정 윤리적으로 온당하다”(115면)고 감싼다. 후자의 경우 연민은 ‘연민 이상의 윤리’가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연민’이 아니니, ‘경계를 넘어설 각오가 되어 있는 연민’이란 일종의 형용모순이 아닌가? ‘관용’ 역시 “근대체제의 바깥에 내몰린 비국민들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내면화”(105면)하자고 할 때와 “상대방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베풀어지는 관용은 얼마나 위선적인가”(114면)라고 할 때가 다르다. 그러나 관용이란 ‘언제나’ 상대방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만 베풀어지는 것, 그의 글은 바로 자신의 글에 의해 그 균열을 드러낸다.
4부 ‘체제 바깥 다른 세상’은 그의 유토피아적 지향과 그 문학적 대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은 지금 한국문학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부분이기에 유독 관심있게 읽었다. 신동엽과 이문구, 송경동의 작품세계를 통해 문학의 비체제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있는 글들은 우리 문학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그가 2000년대 소설가들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것은 그의 다음 작업이 될 것이라 믿는다. 서문에서 그는 “문학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은 나의 다짐이다”라고 말했다. 결연한 다짐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결연함으로 인해 그의 글에는 자유로움이 부족하다. 이제 그의 글에서 비평의 윤리뿐 아니라 비평의 즐거움까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