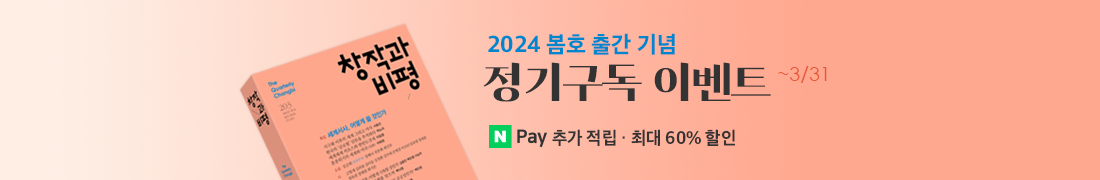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학초점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내의 할리퀸 로맨스 에쎄이
박정대 시집 『삶이라는 직업』
박상수 朴相守
시인, 문학평론가. 시집으로 『후르츠 캔디 버스』가 있음. susangpark@hanmail.net
 “SADANG—나는 SADANG을 <새드앙>이라고 읽는다”(「SADANG 가는 길」, 『단편들』, 세계사 1997)라는 문장. 달콤한 슬픔, 적당하게 부는 바람. 세상에는 2호선 ‘사당’역에서도 슬픔(sad)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계속 이어진 2, 3, 4시집에서도 박정대(朴正大)는 ‘나는 죽어도 너를 잊을 수 없어’라고 절규하지 않고 ‘너는 멀리 있고, 오늘 밤은 쓸쓸하지만 매일 꿈꿀 수 있어서 로맨틱해’라고 말하는 편이었다. 톱밥 난로는 불타오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하릴없이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밤. 박정대처럼 노골적이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한없이 너그럽게 사랑스러운 시인이 또 있을까? 그가 노천 까페 앞자리에 와 덥석 앉으면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10분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를 믿어버리게 될 것 같다. “난 천사요. 1분 전에 이곳으로 왔지. 당신을 사랑해서.” 분명 바람둥이겠지만 꼭 한번 넘어가보고 싶은 사람. 단, 거기는 프랑스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홍대 주차장골목 어디쯤 자리한 까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현듯 그가 『삶이라는 직업』(문학과지성사 2011)을 들고 나왔다면? 삶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설마 박정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뒤척이는 세계의 모습, 그대와 나는 세계에 관여한다 삶이라는 직업으로”(「나의 플럭서스」) 정도에서 개입은 끝나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는 삶의 구체—전쟁 같은 육아,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때론 설거지, 이런 내 정신 좀 봐 지난달 가스비를 안 냈어!—따위의 ‘삶’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SADANG—나는 SADANG을 <새드앙>이라고 읽는다”(「SADANG 가는 길」, 『단편들』, 세계사 1997)라는 문장. 달콤한 슬픔, 적당하게 부는 바람. 세상에는 2호선 ‘사당’역에서도 슬픔(sad)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계속 이어진 2, 3, 4시집에서도 박정대(朴正大)는 ‘나는 죽어도 너를 잊을 수 없어’라고 절규하지 않고 ‘너는 멀리 있고, 오늘 밤은 쓸쓸하지만 매일 꿈꿀 수 있어서 로맨틱해’라고 말하는 편이었다. 톱밥 난로는 불타오르고, 담배를 피우면서 하릴없이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밤. 박정대처럼 노골적이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한없이 너그럽게 사랑스러운 시인이 또 있을까? 그가 노천 까페 앞자리에 와 덥석 앉으면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10분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를 믿어버리게 될 것 같다. “난 천사요. 1분 전에 이곳으로 왔지. 당신을 사랑해서.” 분명 바람둥이겠지만 꼭 한번 넘어가보고 싶은 사람. 단, 거기는 프랑스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홍대 주차장골목 어디쯤 자리한 까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현듯 그가 『삶이라는 직업』(문학과지성사 2011)을 들고 나왔다면? 삶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설마 박정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뒤척이는 세계의 모습, 그대와 나는 세계에 관여한다 삶이라는 직업으로”(「나의 플럭서스」) 정도에서 개입은 끝나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는 삶의 구체—전쟁 같은 육아,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때론 설거지, 이런 내 정신 좀 봐 지난달 가스비를 안 냈어!—따위의 ‘삶’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사실 그의 시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내의 남성판 할리퀸 로맨스 에쎄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가 궁금한 것은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리스본 27 체 담배 사용법」)하는 것. 그는 시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놓는다. 정주하였지만 끝내 유랑을 꿈꾸는 이 사내의 기나긴 몽상을 따라 영화 「동사서독(東邪西毒)」의 사막이, 「아비정전(阿飛正傳)」의 열대림이, 늘 담배를 피워물고 있는 쓸쓸한 양조위가, 그 사이에 빛나는 장만옥, 이젠 만날 수 없는 장국영의 환영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진 적이 있다. 반갑고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고, 로맹 가리가, 베를린 천사의 시가, 빅또르 최가 등장하는 오래된 영화 필름이, 역시 꾸바 산 씨가를 문 나른한 표정의 ‘체’가, 누벨바그 시절의 고다르와 『소립자』의 미셸 우엘르베끄가 백야 횡단열차를 타고 모두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다는 것이니 나는 이 사내의 몽상에 10여년을 넘게 중독되었으면서도 다시 기쁜 마음으로 그의 열차에 탑승하고 만다. 특별한 내용과 의미는 없어도 좋다. 만국의 감정 공산주의자들이여, 모든 사건과 사물을 감정과 분위기로 재배치하라!
“저녁 겸 아침을 든든히 먹고 커피 석잔 담배 넉대, 다시 작업 시작”(「리스본 27 체 담배 사용법」)해서 만들어내는 가공의 세계. 뻔히 가공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드는 이 세계. 밤으로 둘러싸인 세계. 정말로 그의 시에는 낮이 없다. 낮이 없으니 노동이 없고, 노동이 없으니 소위 ‘현실’이 없고, 생존의 문제가 사라지고, 싸움이 없고 절박함이 없다. 모두가 꿈꾸는 제국이 아닌가? 물론이다. 과장하여 보탠다면 좋은 시의 8할이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자신과 삶과 세계를 직시하는 데서 오는 고통과 우울을 동반한다면 박정대의 시에는 우울증 환자를 위한 아로마 감정 테라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시가 되니 놀랍다는 것이다. 그는 부릅뜨고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들여다보거나 멀리 응시한다. 좋아하는 것을 보고, 꿈꾸고, 다시 살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우울이 스며들 수 있겠는가.
다만 고통스러운 것은, 박정대의 시를 읽다가 대한민국의 오늘로 되돌아오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박정대와 현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다. 2011년의 대한민국에서 “누가 노래하는가?//청춘 계급!”(「청춘 계급」)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은 이제 ‘공익광고’ 혹은 ‘유세윤의 UV’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정대는 잘못이 없다. 박정대만큼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 바라지만, 이런 남자를 그리워할 수는 있으나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늘 먼 곳만 생각하는 “떠도는 원소들의 혼합물”(「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같은 이 사내와라면 끝내 고장난 보일러에 대해 상의할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이, 때로, 쓸쓸한 소외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