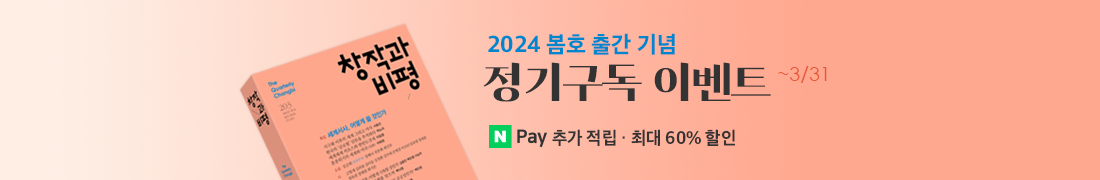특집 | 테러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한반도의 2002년
백낙청 白樂晴
서울대 영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저서로 『흔들리는 분단체제』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민족문학의 새 단계』 등이 있음. paiknc@snu.ac.kr
상대적 안전지대로서의 한반도
작년 9월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테러의 여파는 금세 한반도에도 다가왔다. 한반도와 미국이 다같이 전지구적인 동일 시간대에 속해 있음을 실감하는 또하나의 계기였다. 다른 한편, 크게 보아 동일한 시간대를 공유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정세가 벌어지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좀 색다른 시간표가 가능함을 확인해준 것 또한 9·11 이후의 세계가 아닌가 한다.1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체가 한결 어지럽고 살벌한 세월로 접어든 반면,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지대로 떠오른 느낌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안전도가 특별히 높은 지역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에도 본토가 공격받은 일이 전혀 없던 미국이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거에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겪었고 뒤이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전쟁을 수행했으며 그 전쟁에 승리하고도 ‘전쟁의 해’를 선포하며 후속 테러를 염려하고 있는 데 비한다면, 20세기 중반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래 아직도 ‘준전시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는 오히려 혼란과 위험이 덜한 상황임이 눈에 띄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위험은 엄연히 존재한다. 북한을 ‘불량배국가’(rogue state), 더 나아가 최근 부시 대통령이 의회연설에서 쓴 표현대로 ‘악의 축’(axis of evil)의 일원으로 지목한 미국정부의 자세가 북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전체가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훨씬 엄청난 전쟁의 참화에 휘말릴 것이 뻔하다. 그리고 미 정부의 이런 자세가 북한 자체의 테러지원 행위 때문이라기보다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를 장악한 일부 인사들의 독자적인 계산이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전세계가 하나의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분단체제의 작동에는 세계체제의 패권세력이 깊이 개입해 있다는 진실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는 부시의 최근 발언 이전에도 분명한 진실이었다. 9·11로 인해 북미접촉이 한결 힘들어졌음은 물론, 아프간전쟁으로 한국이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이 이유가 되어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되었고 이산가족상봉 합의마저 이행되지 못했다. 2001년 상반기에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답보’ 상태가 부시행정부 출범에 따른 당사자들의 숨고르기 성격이 짙었다면, 9·11 이후의 정황은 확실히 세계적 규모의 역풍에 휩쓸린 면이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아직껏 전쟁이나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 따져볼 일이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 남한의 경제 또한 큰 동요 없이 9·11의 충격을 이겨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한국은, 애국자법(Patriot Act)의 제정 등 ‘전쟁의 시대’에 준하는 심각한 후퇴를 겪은 미국이나, 아프간전쟁을 계기로 평화헌법 8조의 위반을 결정적으로 공인해버린 일본에 비할 때 꾸준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 세계체제와 분단체제의 실상을 살피는 데서 찾아야 하리라 본다.
9·11 이전의 세계와의 연속성
이미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온 말이지만2 나 자신은 5백년 이상 지속되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수십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으며 동서냉전의 종말은 자본주의의 승리라기보다 그 최종단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에 신빙성을 두고 있다. 이럴 경우 9·11사태 자체가 세계사적 전환점이라기보다는 1989년 이래 본격화된 세계적 혼란기를 미국민을 포함한 다수 인류가 실감하게 된 계기로 인식할 수 있다.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그런 관점에서 테러 직후, “머지않아 2001년 9월 11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들과는 반대로, 오랜 동안 지속되며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암흑의 시기가 될 장기적 투쟁에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로 보이게 될 것이다”3라고 주장했는데, 자기 나라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참사를 두고 너무도 거시적인 관조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4 근본취지는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자체로만 본다면 ‘작은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지나친 표현이다. 9·11의 경험은 아마도 미국민 대다수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적 경험으로 남을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분위기의 변화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사건 직후 부시가 말한 대로 테러가 자유와 민주주의 등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동료들은 실로 망외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른다.
미국에서 시민의 권리─외국인의 권리는 더 말할 것 없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가 일어난 것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도 결코 반길 일이 못된다. 테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또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 이전까지 미국에서 자유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로 이름을 떨치던 인사들까지 열렬한 전쟁지지자로 돌변한 사례를 접할 때,5 애당초 자유와 진보, 그리고 인종을 초월한 인권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과연 얼마나 투철한 것이었는지 새삼 되묻게 된다. 근대 세계체제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원래 인종주의와 긴밀히 결합된 것이었지만, 자본주의가 축적의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했다는 사실은 자유 중에서 자본축적에 방해가 되는 구자유주의적 자유들을 희생할 태세가 선포된 꼴이다. 9·11 이후 수많은 미국 지식인들의 애국주의자로의 변신은 그러한 장구한 과정 속에서─결코 ‘작은 에피소드’랄 수는 없지만─또하나의 전환점을 통과한 데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이 한갓 인상의 수준을 넘는 설득력을 지니려면 인종주의·신자유주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와 더불어 미국역사 특유의 일방적인 자기인식(즉 허위의식)에 대한 탐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일찍이 영국의 소설가 로런스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의문을 상기하는 데 그치려 한다. 로런스에 따르면,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 유럽인들은 제 고장에 남아 싸웠으며 1700년의 싯점에서 영국은 미국의 청교도사회보다 훨씬 자유로운 나라였다. 유럽의 초기 자유주의자들이 전근대적 압제에 맞서 싸우면서 내건 ‘자유’가 커다란 생명의 리듬을 탄 것인 데 반해, 신대륙에서 이를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미국인들의 ‘민주주의’는 항상 무언가 반생명적인 것이었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로런스는 에이헙(Ahab) 선장의 주도 아래 흰 고래 모비딕(Moby Dick)을 광적으로 추격하다가 침몰하는 피쿼드(Pequod)호에서 새 대륙에 뿌리내리지 못한 미국정신의 상징을 읽었는데, 아프간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에이헙 선장의 비유가 나라 안팎에서 거의 동시에 제기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6
눈을 미국 바깥으로 돌리면 9·11 이전과 이후 세계의 연속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프간전쟁에 앞서 걸프전쟁이 있었음은 물론, 세계 도처에서 미국 또는 다른 강대국에 의한 억압과 살상 행위가 근대세계의 역사를 얼룩지게 해왔다. 아랍세계에서 특히 문제삼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폭력행위만 해도 이미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이다. 이런 식의 국가폭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시대’를 맞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더욱 거침없이 자행될 태세이다. 국가적 폭력의 결과로 비국가단체에 의한 폭력이 최소한 냉전시대 수준으로라도 한정되고 미·소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시절 정도의 지구적 질서가 회복된다면 모를까, 국가폭력과 비국가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근과 질병으로 희생되는 인구마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암흑의 시기’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희망적인 이유
그런데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한반도가 비교적 예외에 해당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나는 다시 한번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을 환기할 필요를 느낀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국토분단이나 민족분열, 이념대립에 그치지 않고 세계체제의 민중억압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한 양태로서 세계체제 기득권세력의 이익에 복무해왔다. 실제로 한국전쟁은 동서냉전체제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전쟁과 냉전체제는 역으로 한반도 분단이 일종의 체제로 고착화되도록 작용했다. 이렇게 성립된 분단체제는 한반도 내에서 분단기득권세력을 살찌움과 동시에 세계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호시절을 보장하는 데 긴요한 몫을 해온 것이다. 이제 동서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결정적인 불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반도가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좀더 나은 세월을 내다보게 된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면 보상이다.
하지만 이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수행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지, 억압자들의 좋은 세월에 희생을 치렀다고 해서 억압체제가 흔들릴 때 희생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이 ‘암흑의 시기’라고 하지 않는가! 기성체제가 위협받을수록 기득권자들은 도리어 무자비한 공세로 나오기 일쑤며, 어떤 체제─전체 체제든 아니면 그 하위체제 중의 하나이든간에─가 정작 무너지는 경우에도 일반민중의 삶은 더욱 처참해질 수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가 전쟁으로 파괴된다면 바로 후자에 해당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는다면 전자의 본보기로 꼽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엄연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희망적이라 보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역설적이지만, 한반도에서는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의 위협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에 산발적 국지전이나 한정된 ‘보복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 북쪽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 지 오래임은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려 해도 남한의 초토화와 (미국 당국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보다 더 아플) 주한미군의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 이런 공포 요인에 달린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워낙이 명분이 약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체제’로서 일정한 자기재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지닌 구조로 남아 있다. 전쟁재발의 위험과 동서냉전체제의 뒷받침으로 수많은 저항을 억누르며 지탱해왔을 뿐인데, 진영대립이라는 큰 버팀목 하나가 사라진 뒤로 분단체제의 유지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분단과 분단체제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분단이 체제화될수록 저항 또한 단순한 통일운동이 아닌 분단체제극복운동으로서의 복합성과 창의성이 필요해졌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실력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운동이 분단체제의 흔들림에 일조하고 그 재편 또는 극복의 과정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갖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평화통일의 대의를 확인하고 이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노력들 외에도, 분단체제의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속성에 맞서 민족의 자주력을 증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해온 크고작은 움직임들이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의 건설을 실현가능한 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쪽의 사정에 국한하더라도,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크게는 4·19를 계기로 시작된 경제건설의 일정한 성공과 1987년 6월 이래 지속된 민주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터이며, 더 직접적으로는 199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힘입은 것이었다.7 동시에 6·15선언 실행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데에도, 부시행정부의 출범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정치행태 등의 문제를 떠나, DJP연합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밖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했고 아직껏 분단체제극복운동에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민중역량의 한계를 꼽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2001년 한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남북관계의 후퇴 내지 답보도 그다지 염려할 상황이 못된다. 먼저, 6·15선언의 유효성을 쌍방이 강조하고 있는 한─주로 상대방에게 그 실행을 다그치는 방식일지라도─6·15 이전으로의 ‘후퇴’는 사태의 진실과 동떨어진다. 정부측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6·15가 아니었던들 9·11 직후 한반도정세가 얼마나 험악했을지는 누구나 실감하는 일이다. ‘답보’로 말하더라도, 2000년의 성과가 워낙 눈부셨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훨씬 눈에 띄었을 민간 또는 정부간 접촉들이 답보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진 면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우리가 아무런 통일이나 다 좋다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분단체제극복에 해당하는 변화 즉 민중의 참여가 최대한으로 실현되는 통일과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의 일진일퇴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주도일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건 물론이다. 특히 분단체제극복의 초기단계에서는 6·15와 같은 정부 정상간의 결단과 돌파구 마련이 긴요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에 시민들은 박수나 치고 당국이 마련해준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지켜보고 눈물 흘리며 따라만 가기보다는, 당국간의 합의가 더러 깨지는 불행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민중의 몫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001년의 성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가 후퇴 또는 답보했다는 2001년이야말로 중대한 전진을 이룩한 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6·15선언이 크게 봐서 분단체제에 저항해온 한반도 민중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분단체제극복이라는 대의를 명료하게 의식하며 광범위하게 연대한 운동은 2000년 6월 당시 남북 어디에도 없었다. 남쪽의 경우 대체로 분산되어 진행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여타 사회운동 들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2001년을 지나면서도 분단체제극복운동이 거대한 규모에 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남북교류가 주춤한 데 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민간측의 교류는 큰 중단을 겪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기도 했다. 말썽많았던 ‘8·15 평양 민족대축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DJP공조 붕괴라는 역풍이 주된 결과였지만 민간차원에서의 결과는 달리 평가해야 옳다. 첫째, 이 축전은 그때까지 대북접촉이 허가되지 않았던 부류의 통일운동가로부터 통일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던 인사들까지 각계각층의 수백명 민간인이 대거 북녘땅을 밟고 그쪽 주민들과 접촉한 미증유의 사건으로서, 남북 주민들의 의식 속에 두고두고 미칠 파급효과는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다. 둘째로, 행사기간에 일어난 몇가지 사건과 그에 대한 남쪽 여론의 부정적 반응은 민간활동가들 사이에서 통일운동도 이제는 남한의 대중적 정서에 뿌리내리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는바, 이 또한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분단체제극복이 반드시 통일운동의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다른 민간영역에서의 진전도 주목해야 한다. 상세한 점검을 시도할 계제는 아니지만, 9·11테러나 아프간전쟁의 여파가 한국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연이어 터져나온 각종 부패사건들만 해도, 최소한 한국정부가 야당이나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9·11 덕을 본 게 별로 없음을 말해준다. (미국에서도 엔론Enron 사건이 터지기는 터졌지만, 그러잖아도 당선의 합법성을 의심받던 부시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엔론사의 도산과 그들 자신의 부패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끄떡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극도의 난맥상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화과정은─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라는, 92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 명예총재 취임과는 또다른 차원의 사건을 포함해서─꾸준히 전진해온 것이다.
정부권력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다. 2001년은 특히 정부에 의한 언론사 세무조사와 민간측의 언론개혁운동으로 뜨거웠다. 그 장기적 효과는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요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이 사회의 막강하며 무책임한 언론권력들이 스스로 호된 여론의 심판대에 오른 한해였다.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비판언론’으로 행세하며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일에도 더욱 사납게 나서는 폐단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신문의 사회적 의제설정 및 여론독과점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실감하는 계기도 되었다. 보수야당조차 대북포용 반대일변도로 나가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실정이며, 이른바 ‘조·중·동’의 일원인 『중앙일보』는 ‘정부예산 1% 대북지원’을 새해 ‘10대국가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이것이 경쟁사간의 차별화를 꾀하는 상술이냐 원래부터 대북관계에는 일정한 진취성을 보여온 신문다운 일관된 선택이냐는 물음을 떠나, 어쨌든 ‘조선일보식’으로는 영향력에 한계를 갖게 된 우리 시민사회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무방할 듯싶다.
2001년의 성과로 한가지 더 꼽을 것은 한반도 문제가 드디어 세계 시민운동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점이다. 8·15민족대축전 직전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for Global Peace)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등 국내단체들과 더불어, 방콕에 본부를 둔 ‘남반구에 촛점’(Focus on the Global South) 운동과 미국의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 네덜란드의 초국가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세계 각곳의 5개 시민운동단체 내지 연구단체가 공동주최한 행사였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참석했던 학자, 활동가, 입법부의원들 공동명의로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 및 정의를 위한 서울선언’(The Seoul Declaration for Korean Reconciliation and Global Peace and Justice)을 발표하고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국제회의를 발의했던 필리핀의 월든 벨로(Walden Bello) 교수 등 외국인사들이 어떤 후속구상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현재 나로서 아는 바가 없다. 짐작컨대 9·11로 인한 반세계화운동의 일시적 퇴조와 반전평화운동의 긴급한 요구가 외국의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지 싶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보면 9·11이 반세계화운동에 미친 영향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나며, 특히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은 부시 발언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세계 시민운동의 핵심의제가 되어 마땅하다. 부시가 지목한 이란·이라크·북한이 모두 현싯점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안 먹히는 나라이면서 탈레반정권 하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만만한 상대도 아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남한과 화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새로운 사회가 건설된다면, 이는 세계체제의 기득권자들에게 몇몇 ‘불량배국가’ 또는 테러조직의 건재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평화운동이라는 면에서도 분단체제극복운동은 하나의 전범(典範)일 수 있다. 9·11 이후 ‘전쟁의 시대’에 모든 시민운동은 반전평화운동을 겸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하겠는데, 뽀르뚜 알레그레 회의에서도 폭력시위단체의 참가를 사전에 배제하는 등의 전술적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더 중요한 점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이 훨씬 절박한 문제가 된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회운동이 평화운동으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표와 세계평화라는 의제를 결합하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원래부터 전쟁방지·평화통일의 대의와 당면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결합해온 한반도의 민간주도 통일운동, 즉 분단체제극복운동이 선진적인 역할을 이미 해내고 있는 셈이다.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세계화는 이제 한반도 주민뿐 아니라 세계 민중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8
문제는 2002년
문제는 2002년이다. 새해 벽두 미 당국자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쟁은 미국에 의한 ‘테러국가 응징’에 북한이 반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공격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한 북측의 선제대응으로 터질 수도 있다. 물론 부시 등의 호전적 발언이 엔론 사태를 덮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는 국내정치용이라거나 한국에 전투기 등 무기를 더 사게 만들려는 흥정용이라는 등의 실용주의적 해석도 전혀 신빙성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의 행동에서 실무적 항해사들이 미처 제어하지 못하는 ‘에이헙적’ 성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1994년 6월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문자 그대로 전쟁개시 일보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9
하지만 한반도가 그런 악몽의 터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두세 가지 중요한 이유만 떠올려도 그렇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최근의 북한은 미국을 직접 건드린 실적이 없으며, 오히려─비록 지난 정권 때이긴 하지만─미국의 국무장관을 영접하고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합의했던 상대이니만큼 ‘에이헙’적 광기가 발동할 확률도 그만큼 덜하다. 둘째로, 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공격의 구실로 들먹여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병력과 해외거주 시민들을 살상할 능력으로 치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이나 구 유고연방보다 훨씬 녹록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폭격만이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감행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및 미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히 공습 이상의 장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측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간 성장한 한국경제의 규모로 보나 정치의 민주화 수준으로 보나 한국정부가 그런 자멸적 노선에 동조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열거한 세 가지 중 남한시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대목은 세번째, 즉 한국정부의 대응자세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무모한 강경책에 결코 동조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 작업이 자주외교를 촉구하고 평화와 민족적 대의를 주장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의 자주적 협력과 남한 내부의 제반 개혁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분단체제의 근원적 비자주성과 반민주성을 극복하는 차원으로 성숙할 호기이기도 하다. 종전의 대미의존은 그나마 ‘안보’와 ‘경제’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정부와 그 정책에 영합하는 국내세력들이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경제의 안정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협임을 대중들이 실감하게 된 것이다.
북으로서도 극한적 사생결단용인 두번째 사유보다 첫번째 항목의 비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남한민중의 분단체제극복 노력에 대한 훼손을 삼가야 할 것이다.
위태한 가운데도 낙관을 허용하는 한가지 구체적 사안이 2002년 FIFA 월드컵이다.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는 2월 19〜20일 양일간이나 5월말에 시작하는 월드컵 기간중에 미국의 대북공격이 없으리라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예언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월드컵이 한국 단독이 아니라 한국보다 미국인의 눈에 한 급 높아 보이는 일본과의 공동개최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다시 말해 올봄만 잘 넘기면 한반도는 일단 안전지대로 편입되리라는 것인데, 물론 월드컵 자체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는 전제 아래서다.
‘월드컵의 성공’은 정부와 언론매체들이 쉴새없이 강조하는 금년도의 국가적 목표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질서있게 치러져야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당장의 경제회복과 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드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과 관광, 외국인의 투자 등에서 더욱 장기적인 이득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런 목표 자체에 특별한 이견을 달 생각은 없다. 게다가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된다면─전국민이 허열에 들뜨느니 빨리 지고 빨리 끝나는 게 낫다는 이색적인 우국충정도 없지 않지만─그야말로 기분좋은 일일뿐더러 ‘허열’을 가라앉히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에 남다른 이바지를 하겠다는 국민으로서 이 정도의 목표로 만족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인 동시에 ‘아시아 최초’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녔으며, 이는 일본 단독개최가 아닌 한·일 공동개최임으로 해서만 살아나는 의미이다. 일본만의 월드컵이라면 일찍부터 서양 따라가기의 우등생인 일본이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과정에서 획득한 또하나의 상패에 불과했을 것이다.10 그런데 한·일 공동개최라 해서 ‘아시아 최초’의 의미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서양 따라가기의 명수와 일본 따라가기의 우등생이 합작한 ‘저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이 분단국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한다. 게임의 남북한 분산실시는 이미 기대하기 어려워진 듯하나, 아직도 북한측이 축복하고 간접으로나마 동참하는 월드컵이 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리 될지는 남·북·일 3자관계의 진행에 달린 바 크다. 물론 거의 매사가 그렇듯이 이를 미국이 응원해주느냐 마느냐가 또하나의 중대변수다. 그러나 월드컵의 개최국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이며 월드컵과 병행될 ‘아리랑축제’의 주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이해득실이 막대한 세 당사자의 자주적 결정의 폭은 그 어느 경우보다 넓은 셈이다. 3자간의 원만한 협동이 진행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 일본의 아시아적 정체성 회복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11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만 해도 그렇다. 88올림픽 때처럼 이번에도 월드컵 기간중 손님맞이를 잘 해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경제적인 이득이 뒤따를 건 분명하다. 특히 공동개최국인 일본이 질서의식과 청결, 친절의 정신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선 사회라는 점에서 좋은 공부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험 전날의 벼락공부나 바이어 접대용 응급정돈에 그친다면 88올림픽 이후 무질서사회가 고스란히 복원되었듯이 또 한번의 겉치레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기야, 경제적 이득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상관없는지 모른다.
일본을 배우더라도 오래 남을 공부를 하고 일본과 전세계에 무언가 오래 남을 선물을 안겨주려면, 분단체제극복이라는 세계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분단체제극복과정에서의 결정적인 한 고비에 해당하는 월드컵을 치른다는 긍지를 바탕으로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 청결과 친절을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월드컵조직위원회더러 ‘Dynamic Korea’ 대신 ‘분단체제극복’을 대회표어로 내걸라는 건 무리겠지만, 시민들은 그런 정신으로 임해봄직하다. 그럴 때 16강진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북돋움이 될 것이요, 설혹 좌절되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와 응원단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마음의 여유를 지닐 것이다.
월드컵을 마치고 나면 머지않아 부산 아시안게임이 뒤따른다. 여기에는 북한 선수들도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체육계의 시간표로도 한반도의 2002년은 세계사의 어둠 속에서 예외적인 밝음을 기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
- 이런 의미의 ‘시간대’와 ‘시간표’에 관해서는 졸고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창작과비평』 2001년 봄호 18면 및 23〜25면 참조.↩
- 예컨대 앞서 언급한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 19면.↩
- 빙엄턴대학 브로델쎈터 홈페이지에 실린 월러스틴의 2001년 9월 15일자 Comment No. 72, “September 11, 2001─Why?”(http://fbc.binghamton.edu/72en.htm) 참조. 『한겨레』 2001년 9월 20일자 8면에 「낡은 테러 작은 투쟁」으로 번역됐음.↩
- 월러스틴 자신이 작년말의 한 강연에서 그러한 자기비판을 하기도 했다(“America and the World: The Twin Towers as Metaphor,” Charles R. Lawrence II Memorial Lecture, Brooklyn College, Dec. 5, 2001; 텍스트는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홈페이지의 9·11사태 의견게시판 http://www.ssrc.org/sept11/에서 읽을 수 있음).↩
- 그 일부가 본지 이번호에 실리는 죠지 캇찌아피카스 「9·11과 미국인의 양심」에 적시되어 있으며, 위의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게시판에서도 많은 예를 접할 수 있다.↩
- D.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1923), Penguin Books 1971 참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특히 제1장과 5장, 『모비딕』론은 제11장 ‘Herman Melville’s Moby Dick’ 참조. 이 책에 대해서는 졸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창작과비평사 1985)에 실린 「미국의 꿈과 미국문학의 짐」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해당 대목은 213〜15면과 221면, 232〜34면).
국내에서 9·11 이후 미국정부 및 주류사회의 반응과 에이헙 선장을 처음 연결시킨 것은 한기욱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3): <모비딕> 이야기와 타자의 불가해성」(디지털창비http://www. changbi.com 자유게시판 2001/09/20)이었을 듯싶은데, 같은 날 finching의 댓글(〔RE〕 ‘서투른 비유’를 사용한 또 한 사람」, 2001/09/20)을 통해 싸이드가 바로 며칠 전에 동일한 비유를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Edward Said, “Islam and the West are inadequate banners” (The Observer, Sunday September 16, 2001) 중 에이헙 선장과의 심상찮은 유사성을 지적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Inevitably, then, collective passions are being funnelled into a drive for war that uncannily resembles Captain Ahab in pursuit of Moby Dick, rather than what is going on, an imperial power injured at home for the first time, pursuing its interests systematically in what has become a suddenly reconfigured geography of conflict, without clear borders, or visible actors.”
물론 싸이드의 발언은 ‘우려 표명’의 수준이지 그가 미국의 정신사를 로런스적 시각에서 읽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로런스적 읽기는 에이헙=부시(또는 미국정부), 모비딕=아프가니스탄(또는 이슬람세계) 식의 등식화와 거리가 멀다. 마치 인종박물관처럼 가지각색인 선원들, 실무적으로 유능하지만 항로를 바꾸지는 못하는 항해사들, 남다른 위엄과 사명감마저 지녔지만 결국은 반생명적이고 병적인 집념으로 선박과 선원을 파멸로 몰고 가는 선장─이런 피쿼드호의 항해를 미대륙에 이주한 백인들이 자신 및 세계와의 진정한 화해에 도달하기 전에 겪게 마련인 하나의 역사적 운명으로 읽어내는 시각인 것이다.↩ - 필자가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데 대해 이수훈 교수는 디지털창비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백낙청 교수의 〔통일작업과 개혁작업〕에 대한 논평1」, 2001/09/11)에서 “이 언명은 정권교체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연결지우고 있다. 쉽사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아예 불가능했을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선한 1994년 여름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불발되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는 같은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둘다 가상적인 씨나리오를 묻는 질문이지만, 1994년의 일은 매우 구체적인 일정이 실행 직전에 특정인의 급사(急死)라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무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적 설득력있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김주석의 사망이 아니었다면 정상회담이 그때 성사되었으리라 보는 것이 일단 상식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기까지는 정권교체가 있어야 했고’라는 저의 진술은 ‘일종의 결과론적 해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공격 위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의 전직 대통령이 중재해서 급작스레 마련된 정상회담이 6·15 평양선언에 견줄 ‘역사적 성과’가 될 수 있었으리라고는─이 또한 가정법에 근거한 진술이긴 하지만─상식적으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회담 도중의 결렬 가능성은 차치하고도,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합의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 김주석 사망 후의 ‘조문파동’에 버금가는 반작용이 뒤따랐을 가능성 들도, 기왕에 가정법으로 진술할라치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법을 바꾸어, 정권교체를 이룩한 뒤에 남북문제에 관한한 오랜 준비와 확고한 신념을 지닌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6·15 이후의 온갖 반작용이 따랐건만 하물며 김영상·김일성 회담 뒤의 혼란과 반동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식으로 추리를 진행시켜봄직도 합니다. 어쨌건 만났다는 사실 자체의 역사적 의미는 있었을 터이고, 그에 따라 분단체제의 현실은 또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겠지요. 하지만 비록 미흡한 형태로나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대표하는 국민적 역량의 증대가 없이도 6·15의 성과가 가능했으리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6·15가 없었다면 얼마 전의 ‘8·15 평양민족대축전’도 없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이교수도 언급하신) 후속 소동도 없었겠지만, 그 떠들썩한 소동에도 불구하고 공안정국으로의 본격적인 복귀는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역시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우리 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한 사례이자 6·15가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이수훈 교수의 비판에 답합니다(2)」, 2001/10/02)↩ - 9·11 이전의 싯점에서이긴 하지만 이러한 색다른 ‘세계화’의 필요성을 나는 앞에 언급한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제기한 바 있다. 회의자료집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20001. 8) 5〜9면에 실린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참조.↩
- 이 시기의 소름끼치는 실상에 대해서는 돈 오버도퍼의 저서(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ddison-Wesley 1997)가 가장 상세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 책을 읽지 못했고 브루스 커밍스 등 다른 논자들의 언급을 통해 알 뿐이다. 앞의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 자료집 중 Bruce Cumings, “The New Danger in Korea,” 25면과 주31 참조.↩
- 물론 한국이 단독으로 개최한다면 그 점은 달라지지만, 단독개최는 한국민에게 감당 못할 짐이 되었으리라 본다.↩
-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교수는 국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월드컵이 북·일 화해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겨레』 2001년 10월 29일자 해외논단 「화해의 월드컵을 위하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