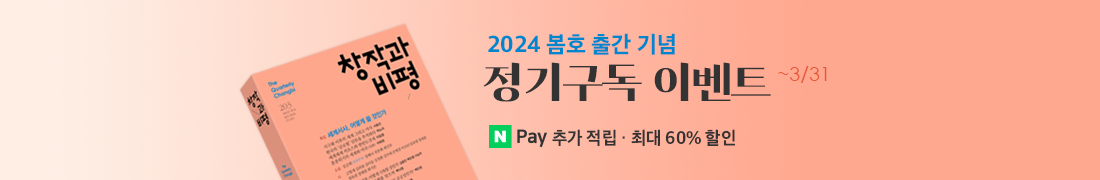특집 | 우리 시대 문학/담론이 묻는 것
현대시와 근대성, 그리고 대중의 삶
백낙청 白樂晴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저서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백낙청 회화록』(전5권) 등이 있음. paiknc@snu.ac.kr
1. 언어의 실험, 문학의 실험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요즘 활발하다. 특히 진은영(陳恩英)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를 계기로 한층 활기를 더한 느낌이며, 2000년대 한국문학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새로운 어법의 시와 그 정치적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진은영의 글이 하나의 계기를 만든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다. 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우선 그 자신이 주목받는 신예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솔한 개인적 고민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동시대 많은 시인들의 문제의식을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 이것은 창작과정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문제이다. 나는 이 난감함이 많은 시인들이 진실된 감정과 자신의 독특한 음조로 새로운 노래를 찾아가려고 할 때 겪는 필연적 과정일 거라고 믿고 싶다. (69면)
이런 고민에 따른 성찰을 그는 랑씨에르의 저서 『감성의 분할』1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수많은 문헌 중에 자신의 논지에 딱 맞는 한권을 집어내어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 또한 글의 매력이며 만만찮은 내공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미학’이라든가 ‘감성’이라는 번역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다. 예컨대 책제목도 ‘감각적인 것의 분배: 감성론과 정치’로 읽을 때 그 “말 자체에 이미 그의 문제의식과 결론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71면)는 점을 일깨워준다.2
그러나 진은영의 문제제기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랑씨에르의 ‘감성적 예술체제’에서 강조되는 ‘감각적인 것의 자율성’이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곧잘 내세우는 ‘예술의 자율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이다.3 “랑씨에르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전통과 결별하여 모험적인 실험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감성적 분배에 참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미학적-감성적 체제에서는 시도되는 모든 새로운 실험들이 감성적 특이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예술의 정치적 잠재성은 (…) 예술의 자율성이 아니라 감성적 경험의 자율성에 의해 규정된다.”(77면)4 그리하여 “삶과 정치가 실험되지 않는 한 문학은 실험될 수 없다”(84면)는, 감당하기 결코 수월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독자로서는 그런 실험이 진은영 자신이나 동시대 시인들의 문학에서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말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법하다. 그러나 창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이나 동료의 작업을 평하기가 껄끄러운 면도 있었을 테고 섣부른 작품론이 글의 짜임새를 흩어놓을 수도 있으므로 작품론이 없었던 점을 탓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 그 작업은 평론가의 몫인데, 나 자신은 이 분야에 너무 생소한 탓에 본고의 논지가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의 단편적인 진술로 그칠까 한다.
진은영 자신의 시는 “의미의 가독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부정하고 기묘함을 극단화”(82면)하는 흐름의 일부이긴 하되 극단적인 예는 아닌 것 같다. 첫 시집의 표제작 「일곱개의 단어로 된 사전」(『일곱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지성사 2003)만 해도 그 낱말풀이가 상식인의 의표를 찌르는 건 분명하지만 나름의 잠언적 가독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자본주의’와 ‘문학’ 항목을 보면 시의 정치성에 대한 시인의 고민이 랑씨에르와의 만남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백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일곱개의 단어로 된 사전」 2, 3연
동일한 시집의 「시(詩)」나 다음 시집의 「앤솔러지」(『우리는 매일매일』, 문학과지성사 2008) 같은 작품에서도 시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느낌을 읽는 데 넘기 힘든 벽은 없다. 그리고 후자에서 시인의 속에 있는 다섯명의 시인 중 기존의 공인된 유형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엉터리’에 대해 저자는 은근한 자부심을 토로한다.
마지막 사람은 엉터리
서툰 시 한 줄을 축으로 세계가 낯선 자전을 시작한다
-「앤솔러지」 마지막 2행
그런데 그의 시들이 과연 세계의 ‘낯선 자전’을 얼마나 시작하고 있는가? 나로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지만, 「물속에서」 「나의 친구」(『우리는 매일매일』) 등 여러 매력적인 작품을 읽을 때, 그가 단순한 언어실험에 안주하지 않는 ‘문학의 실험’을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든다.
가독성을 한층 눈에 띄게 부정하며 각광을 받은 최근의 예로 『기담』(문학과지성사 2008)의 김경주(金經株)와 『소설을 쓰자』(민음사 2009)의 김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시집이 나의 주목을 끌었는데, ‘김언 시집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가 달린 신형철(申亨澈)의 해설이 이 난해한 시들을 되새겨보는 일을 도와주는 훌륭한 고객 써비스를 제공했다. 해설은 “이 책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 하는 책”5임을 강조하는데, 언어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발언 자체는 ‘백명의 민중’을 포기하고 ‘한명의 과학자’를 움직이라는 명령이건 ‘사건의 시학’이건(166면 및 190면) 지금쯤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요는 정상적인 모국어 사용으로부터의 “전적으로 의도적인 일탈”(168면)이 어떤 언어를 낳았고 어떤 문학을 낳았느냐는 것일 터이다.
아무튼 김언의 「문학의 열네가지 즐거움」을 시 또는 문학을 거론하는 진은영의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김언의 언어실험이 훨씬 ‘과격한’ 것임을 실감할 수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고통에 사족을 달아 줄 수 있다는 것
자기 전에 오줌을 누고 침을 뱉을 수 있다는 것
거품이 인다는 것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냄새나는 친구들과 집을 같이 쓴다는 것
밟히는 대로 걷고 숨쉬는 대로 말하고 이제는 참을성을 기르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오줌을 참듯이
똥 마려운 계집애의 표정을 이해한다는 것
빨개진다는 것 벌게진다는 것 이것의 차이를
저울에 달아 본다는 것 눈금을 타고 논다는 사실
시소게임 하듯 사랑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단어 하나에도 민감한 사상을 다 용서할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모처럼 좋아지려는데
여기서 시작하고 저기서 끝난다는 것
아니면 (…)
-「문학의 열네가지 즐거움」 부분
여기서는 진은영처럼 기발하지만 잠언적인 의미로 찬 시론을 펼칠 의지가-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훨씬 미약하다. 오히려 신형철이 「아름다운 문장」을 두고 쓴 표현을 빌리면 “시인의 의도가 아니라 말들 자신이 시를 끌고 간다”(183면)는 인상을 줄 정도로, ‘시론’에 대한 독자의 관념과 동떨어진 말들이 이어진다. 물론 이것이 통념을 뒤엎으려는 ‘의도’마저 잊은 채 진짜로 ‘말들 자신이 시를 끌고 간’ 작품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 시만 해도 무의미한 언어유희는 결코 아니며, 말이 말을 낳는 재미와 더불어 생각을 촉구해주는 재미를 제공한다. 특히 바로 다음에 실린 짤막한 문답형의 시 「당신은」과 함께 읽을 때 오늘의 우리 사회와 문학에 대한 시인의 오연하고도 신랄한 비판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작품을 인용해가며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성격상 그 작업을 생략하지만, 자세히 논하고 싶은 작품 중 하나가 「분신」이다.6 신형철의 해설은 “다소 불친절한 방식으로 이 시는 ‘분신’이라는 사건과 ‘말’ 혹은 ‘문장’을 이어놓으면서 이 분신을 시작(詩作)의 은유로 읽게 만든다”(187면)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작품의 일면을 예리하게 꿰뚫은 통찰임은 분명하다. 나 자신은 그러나 이 시가 ‘분신’이라는 사건 자체를 독특한 언어로 포착한 점-사실주의적으로 모사한 게 아니라 언어로써 구현한 점-을 더 평가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분신자살은 일단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띠기 십상인데, 김언은 그때마다 ‘열사’를 운위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고 신형철의 말대로 “특유의 무정한 스타일”(같은 면)을 구사한다. 그러나 냉소주의와도 무관하여 그 충격적인 순간을 사건화하는 데 성공한다. ‘말’이 제 구실을 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한다.
최근의 한국 시단에서 난해한 실험시가 어느덧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 말았다는 우려는 그것대로 근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진지하고 의미있는 언어실험을 수행하는 시인이 진은영, 김언 등 한둘에 머무는 것이 아님 또한 분명하다. 나 자신은 그런 작품을 널리 섭렵하지 못했고 개별적인 사례의 문학적 성취도를 가늠할 능력도 부실하다. 그러나 예컨대 김행숙(金杏淑)의 『사춘기』(문학과지성사 2003)와 『이별의 능력』(문학과지성사 2007) 같은 시집은 김언의 『소설을 쓰자』 못지않게 난해한 운산을 요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말들의 운행에 더욱 순수하게 몰입한 결과라는 느낌을 준다.
이런 시인들을 대하노라면 산사의 선방에 들어앉아 용맹정진하는 선승(禪僧)들이 연상되기도 한다. 속인의 눈에 그들은 세상일을 나 몰라라하며 무위도식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겉모양만 그럴듯한 ‘땡추’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수행이 있기에 불가(佛家)의 중생제도 사업이 가능한 것이며, 그런 의미로 일종의 특공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큰 깨달음이 세속의 현장에서 대중의 언어로 중생과 소통하는 능력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런 대승(大乘)의 길을 위한 좀더 원만한 공부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모더니즘과 모더니티
예술의 특공대원들이 곧바로 정치실험의 전위부대로 나선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진은영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바로 그런 사례들을 서구문학사에서 찾아본 것이 이장욱(李章旭)이다(「시, 정치 그리고 성애학」, 『창작과비평』 2009년 봄호). 그는 이 작업을 현대예술에서 ‘새로움이라는 역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행하는데, 두가지 모두 “문학의 자율적 영역이 세계와 만나는 절합 지점에 대한 질문”(297면)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문학의 자율성을 두고, “자율성을 신화화하는 소위 예술지상주의적 태도는 치기만만한 것이지만, 반대로 삶/정치의 내부로 환원될 수 없는 이 ‘잉여’ 혹은 ‘불순물’이 바로 문학의 가치”(311면)라는 그의 주장은 표현을 달리했을 뿐 랑씨에르와 진은영의 논지에 이어지며, 예술의 ‘자율성’은 ‘반 자율성’(semi-autonomy)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주장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7
이장욱은 “삶과 예술의 관련성이 극도로 일치했던(혹은 일치시키고자 했던) 예들”(304면)을 주로 20세기 서양에서 찾아본다. 볼셰비끼 혁명 직후 러시아의 레프(Lef, 예술좌익전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관제화되기 전 초기형태로서의 유물론 미학, 마리네띠(F. Marinetti) 등 이딸리아의 미래파,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뗄껠』(Tel Quel)지 집단이나 ‘국제상황주의’ 집단 등, 그 사례는 풍부하고 다양하다.8 그러나 이장욱의 지적대로 “삶의 실험과 문학적 실험의 일치에 대한 전위의 기획이 파탄을 맞이한 것은 러시아만의 현상이 아니다.”(307면)
이에 대해 이장욱은, “하지만 이 경험들을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례들로부터 모종의 암시와 열기를 느낀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아닌가? 명약관화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으되, 그 없음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문학이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정답이 없는 물음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문학이다”(310면)라는 명제로 나아간다. 이 명제 자체는 십분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타당한 명제와 저들 사례에서 느끼는 “모종의 암시와 열기”를 구실로 실패의 엄중함을 직시하는 작업을 회피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명약관화한 답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삶과 문학의 순연한 일치라는 또다른 이상주의의 산물”(305면)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획의 실패는 이장욱 스스로 강조한 바 있는 ‘리얼리즘’-사실주의가 아니라 ‘이상주의에 반대되는 현실주의’로서의 리얼리즘-의 실패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시인은 이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요컨대 그 ‘폐허’에 내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응시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영혼’(헤겔)의 ‘타락’을 스스로에게 용인하는 일이며, 심지어 그것을 요청하는 일이기까지 하다. 이 ‘타락’은 자신의 삶이 이 세계에 대해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을 응시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세계의 타락을 넘어설 ‘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것은 위험한 리얼리즘일 터이다. 하지만 이것은 혹시, 불가피한 리얼리즘은 아닌가? (302~303면)
저들 이상주의자는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락’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삶과 예술의 관련성이 극도로 일치”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장욱이 세심하게 괄호 안에 토를 달아놓은 대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그들은 결국 ‘시’를 발생시키는 기본조건에 온전히 충실했달 수 없다. 비유컨대 참선공부에서 일정한 경지에 달했다고 곧바로 경세사업에 뛰어든 승려처럼 파국을 기약한 꼴이었다. 우리는 저들의 열기와 부분적 성취에 충분한 경의를 표하면서도-또한 그 누구도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임을 인정하면서도-그것이 사업의 실패인 동시에 원만한 공부의 실패인 점을 천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대예술에서 삶과 예술의 관계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장욱의 사례들이 편중된 데는 지면의 제약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예술’과 ‘모더니티’ 같은 개념의 용법을 보면 또다른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 그가 검토대상으로 삼은 ‘현대예술’이나 진은영을 인용하며 언급한 ‘모더니즘’, 꽁빠뇽(A. Compagnon)의 저서가 다루는 ‘(미적) 모더니티’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 상이한 용어 자체가 혼란스러울 것은 없다(이장욱, 297면 및 300면). 그러나 또다른 인용대상인 마셜 버먼의 ‘모더니티’만 해도 그 외연이 한결 넓으며,9 만약 ‘모더니티’를 ‘근대’ 또는 ‘근대성’으로 번역한다면 대대적인 시각조정이 필요해진다. 특히 근대를 세계사 속에서 자본주의의 시대로 이해할 경우, 그 내부의 비교적 새로운 시기로서의 ‘현대’와 ‘현대 이전의 근대’ 사이에 어떤 단절과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요긴해지는 것이다.10
근대(모더니티)의 진행과정에서-더욱이 예술 분야에 주목할 때-보들레르(C. Baudelaire)가 하나의 “기원으로 정초된”(301면) 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나 ‘현대 이전’이나 모두 자본주의 근대로서의 공통성을 지닌 점을 외면하거나 보들레르 이전에도 예의 ‘현대예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시하게 되면, 김수영(金洙暎)의 ‘온몸’을 끌어댄 이장욱의 ‘성애학’이 원만해지기 어렵다.
오늘의 이질적인 시적 경향들은 어떤 것이 저 은유적인 ‘온몸’에 조응하는 것인지를 두고 경합한다. 어떤 시가 제 삶을 떠나 머릿속의 가상을 창안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지, 어떤 것이 그것으로 일종의 자기위안에 안주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제 ‘몸’의 외부에 완성되어 있는 틀의 반복에 머물러 있는지를 상호 조명한다. (313면)
이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다만 이때의 ‘경합’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그 참가범위가 특정한 ‘모더니티’의 개념, ‘현대예술’ 개념을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엄연히 근대의 공동산물인 온갖 ‘이질적인 시적 경향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자기 몫을 주장하며 경합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이 필요할 것이다.
3.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와 근대예술
랑씨에르의 세가지 ‘예술체제’-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체제’(ethical regime)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이론화한 ‘시학적-재현적 체제’(poetic-representative regime) 그리고 근대(또는 현대) 특유의 ‘미학적-감성적 체제’(aesthetic regime)-에 관해서는 진은영의 소개(앞의 글 72~80면)를 출발점으로 삼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그런데 『감성의 분할〔감각적인 것의 분배〕』에서 이들 예술체제를 설명하는 대목은 ‘예술체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모더니티 개념의 결점에 대하여’(Artistic Regimes and the Shortcomings of the Notion of Modernity)로 되어 있다. 예술체제론이 곧바로 모더니티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랑씨에르가 모더니티 개념의 ‘결함’을 말하는 까닭은, 그것이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의 특성에 주목하는 대신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재현에서 비(非)재현 또는 반(反)재현으로’ 같은 순차적 이행의 개념을 앞세우기 때문이다(PA 24면, 국역본 31면). 그는 이런 식의 단순화에 따른 모더니즘의 이념이야말로 근대적 예술체제의 불가피한 혼란스러움을 제거하고자 발명된 ‘방벽’이라고 못박는다.11 따라서 모더니즘이 단순화한 이런 ‘모더니티’와 단절했다고 자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의 근대적 성격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아 ‘모던/포스트모던’ 간의 ‘단절’을 부정한다.12
그런데 랑씨에르 자신의 ‘모더니티’가 ‘근대’와 ‘현대’ 어느 쪽에 가까운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으로 그는 발자끄를 포함한 세칭 사실주의 소설가들에 많은 논의를 할애함으로써 ‘보들레르 이후의 현대예술’이라는 현대주의적 국한을 넘어서는가 하면, 다른 한편 모더니티를 18세기 후반 이후, 즉 칸트와 실러 등의 미학론에서 ‘감성적 예술체제’의 이론적 기초가 세워진 이후로 설정하고 말라르메(S. Mallarmé)에 와서야 의식적인 예술기획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아무래도 ‘현대예술’에 편중된 인상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주의에 대한 그의 발언은 어쨌든 의미심장한데, 국내 논의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것 같다. 이 대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근대’의 성격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더니즘의 모더니티 개념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랑씨에르는 ‘재현적 예술체제’로부터의 이탈이 재현의 거부를 뜻하지 않음을 밝힌다.
미메씨스 밖으로의 도약은 결코 형상적 재현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약의 시발점은 자주 사실주의(realism)라 불려왔는데, 사실주의는 결코 닮음의 중시(valorization of resemblanc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닮음의 기능을 규정하던 구조들의 파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적 사실주의는 무엇보다도 재현의 위계들(묘사에 대한 서사의 우위라든가 소재들 간의 위계질서 같은 것)의 전복(…)을 뜻하는 것이다. (PA 24면, 국역본 32면)
따라서 랑씨에르가 미학적-감성적 체제의 사례를 플로베르뿐 아니라 발자끄와 위고, 심지어 17세기 초의 『돈 끼호떼』에서도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다.13 그러나 『돈 끼호떼』나 발자끄의 『마을 신부』(Le Curé de village)에 관한 논의가 주로 ‘문학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단편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14 사실주의가 ‘닮음(즉 모사의 정확성)의 중시’로 환원될 수 없음을 명시한 대목에서도 ‘재현적 체제’의 위계질서를 전복한 점이 주로 강조되고 근대의 도래와 더불어 예술에서 사실적 재현이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된 점에 대한 인식은 미흡해 보인다.
한국 평단에서는 ‘닮음의 중시’로 환원되지 않는 realism을 지칭하기 위해 ‘사실주의’ 대신 ‘리얼리즘’ 또는 ‘현실주의’라는 별도의 용어를 선호해왔다. 이러한 리얼리즘 문학의 의의를 고전주의와 대비해서 살펴본 나 자신의 발언을 좀 길지만 인용해본다.
장르의 혼합 현상과 더불어, 리얼리즘 문학에 이르러 소멸되다시피 하는 또 하나의 고전적 구별은 이른바 스타일(문체·양식)의 분리 원칙이다. (…) 이것 역시 단순한 양식상의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는 역사, 곧 예전과 달라진 세계와 예전과 달라진 인간의 세계인식의 산물인 것이다. 그 결과는 앞서 거론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명제 자체에 일정한 수정을 가할 만큼 엄청나다면 엄청나다. 즉 문학은 실제로 일어났기보다 일어남직한 일을 말해준다는 대원칙만은 그대로 남는다 해도, ‘일어남직한 일’의 정립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수밖에 없거나 일어나야 마땅한 일 들에 대한 사실적(事實的) 인식-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역사가’의 인식-이 전혀 새로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주의의 사실성(寫實性)이 갖는 본질적 의의는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세계인식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15
그렇다고 ‘재현’ 또는 ‘현실반영’ 그 자체를 예술의 본분으로 설정하는 데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16 진리의 세계가 사실과 현상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실이 곧 일반적 진실을 담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야말로 오히려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의 속성이랄 수 있으며 랑씨에르가 강조하는 새로운 예술의 ‘민주적’ 성격과 부합한다.
랑씨에르가 리얼리즘론이라는 특정 담론에 얼마나 정통한가를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리얼리즘 논의를 제대로 되새기고 천착할 때, 랑씨에르 예술체제론의 중요한 통찰들을 그것대로 수렴하면서 근대예술의 전개과정에 대해 훨씬 원만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그가 편의적으로만 거론하는 세르반떼스라든가 (내가 읽은 범위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셰익스피어 같은 근대 초기의 작가들이야말로 리얼리즘 문학의 거장인 동시에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술가들이라는 점을 온전히 인식하기에 유리한 관점이 그러한 리얼리즘론이다. 동시에 블레이크나 워즈워스의 시,17 그리고 소설에서 발자끄뿐 아니라 스땅달, 디킨즈, 도스또옙스끼, 똘스또이 등의 문학이 그런 성취의 맥락에 놓이며, 플로베르나 말라르메에 이르러 그중 어느 부분-통상적인 리얼리즘론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더욱 첨예해지긴 하지만 동시에 그 분야의 ‘특공대 작전’으로 왜소화된 면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리얼리즘론은 동시에 근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라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근대 속에서 최근 시기의 ‘현대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더니즘은 강렬한 근대극복 의지를 과시하지만 실제로 의도한 만큼의 극복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많은 경우 과거의 예술보다 훨씬 손쉽게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편입되곤 하는데, 이것이 앞시대의 대가들-또는 20세기에 와서도 토마스 만(Thomas Mann)이나 로런스(D.H. Lawrence) 같은 ‘덜 전위적’인 작가들-이 보여준 ‘이중과제’에 대한 한결 원숙한 접근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3개의 예술체제라는 랑씨에르의 분류법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자신이 거듭 강조하듯이 ‘재현적 예술체제’와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 사이에 엄격한 단절은 없다.18 하지만 ‘미메씨스’를 장르와 양식 및 소재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의 시학-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기원하지만 실은 근대의 신고전주의에 와서 더 엄격히 적용되는 시학-이라는 의미의 ‘재현적 체제’(representative regime 또는 mimetic regime)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미메씨스(mimesis) 내지 재현이 모든 예술체제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흐려지고 만다. ‘재현적 체제’의 문제점이 신고전주의적 규범 문제로 축소되기 십상인 것이다.19 게다가 미메씨스의 인식론적 기능을 예술성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재현의 인식기능을 수용하는 예술론이 고대·중세·근대의 작품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 체제’ 논의 역시 다분히 일면적이다. 플라톤이 그의 이상적 공화국에서 시인을 배제한 것이 예술에 대한 윤리의 우위를 설정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플라톤이 시의 독자적 영역에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다. 「이온」(Ion)편에서 시인의 ‘영감’ 내지 ‘광기’를 설파한 것이 훗날 낭만주의의 천재론을 오히려 북돋운 데서 보듯이, 그는 시 특유의 기술과 성능이 있음을 인정했고 다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척하는 데 기준이 된 것이 바로 ‘미메씨스’의 진실성 문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윤리적 체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적-재현적 체제’ 사이에도 무시 못할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윤리적 명제를 앞세워 예술을 억압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그것이 진부한 도덕주의의 표현이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나찌의 ‘민족사회주의’ 같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예술작품의 부담없는 즐김’을 표방하거나 반대로 ‘비인간적인 것’ 또는 ‘숭고한 것’을 내세운 현대의 한층 교묘한 윤리적 예술론 또한-랑씨에르가 『미학 안의 불편함』에서 ‘윤리로의 선회’라는 제목으로 날카롭게 분석하듯이(‘The Ethical Turn of Aesthetics and Politics’,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경계해야 옳다. 그러나 윤리적 충동 자체는 인간의 모든 언행에 묻어나게 마련이며 예술의 ‘효용’ 또한 정도의 문제요 그 좋고 나쁨의 문제일 뿐 실제 작품에서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요인이다.
물론 이런 윤리적 차원과 현실적 효용은 ‘예술의 자율성’이 아닌 ‘감각체험의 자율성’에 근거한 예술이 태생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 랑씨에르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것을 환기하는 일이 그의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 개념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예술작품은 아마도 태곳적부터 윤리적이고 재현적이면서 미적(〓감각체험적)이기도 했으리라는 점이 랑씨에르적 분류법의 도식적 적용으로 간과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4. 시적인 것과 대중의 삶-결론을 대신하여
랑씨에르에 대한 극히 한정된 독서를 바탕으로 그의 예술체제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것은 한국시의 현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였다. 첨단의 언어실험을 감행하는 일군의 시인들을 선승에 빗댄 바 있지만, 대중에 대한 불신과 때로는 경멸마저 포함하는 일종의 엘리뜨주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 ‘미학적-감성적 예술체제’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선수행을 통해 저 하나 깨끗이 간직하는〔獨善其身〕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궁극에는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요 성불(成佛)과 제중(濟衆)이 둘 아님을 망각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듯이, ‘감각적인 것의 배분’을 바꾸는 시적 돌파가 반드시 난해한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고집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대중이 감동하거나 위안을 느끼는 예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는 경계할 일이다.20
아무튼 이장욱이 제의한 이질적인 시적 경향들 간의 경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견 익숙한 감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들을 미리부터 제외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시 또한 감각체험의 특이성을 구현하는 것 아닌지를 사안별로 판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정지용(鄭芝溶)의 「향수(鄕愁)」를 보자. 제목 그대로 향수라는 낯익은 정서를 환기하는데다 친숙한 토속적 언어로 씌어졌고 노래 가사로도 이름난 작품이다. 하지만 이를 ‘낡은 서정’으로 간단히 제외해버린다면 ‘온몸’의 시를 향한 ‘경합’을 사전에 제약하는 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시야말로 누구나 쉽게 읽지만 결코 아무나 쓸 수 없는 난작(難作)의 시가 아닐까 싶다. 이 점은 같은 애창곡 가사인 이은상(李殷相)의 「가고파」에 비교할 때 실감된다. 어릴적 고향의 평화로운 바다를 “꿈엔들 잊으리오”라고 그리워하며 “가고파라 가고파”를 호소하는 작품과는 표현 하나하나의 구체성도 격이 다르거니와,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를 되뇌는 ‘나’의 정서 자체가 질이 다르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민영·최원식·최두석 편 『한국현대대표시선 I』 증보판, 창비 1993, 89~91면)
처음부터 ‘이향(離鄕)’을 꿈꾸었던 자아를-지용의 다른 시 「고향」의 표현을 따르면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인 그런 복합성을-‘향수’를 노래하는 중에도 의식하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여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을 그리워하는 다음 연에서 어린 누이가 거의 전설적인 면모를 얻는 반면, 아내에 대한 정서는 사뭇 다르다. 복합적이며 미묘하기까지 하다. 그 시절의 관습대로 결혼했던 신지식인 남성 대다수처럼 무덤덤한 감정이지만, 상당수의 경우와는 달리 본처를 버렸거나 버리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삭 줍던 곳’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아내 또한 ‘향수’의 대상으로 자리잡는다. 「향수」가 이처럼 적확하고 생생한 언어구사로 상투적 감정의 틀을 깨는 데는 저자가 “함부로 쏜 화살”처럼 객지를 돌며 세련된 모더니스트의 안목을 획득한 점도 긴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정서지만 가독성이 높은 시의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진눈개비 치는 백리 산길
낮이면 주막 뒷방에 숨어 잠을 자다
지치면 아낙을 불러 육백을 친다
억울하고 어리석게 죽은
빛 바랜 주인의 사진 아래서
음탕한 농짓거리로 아낙을 웃기면
바람은 뒷산 나뭇가지에 와 엉겨
굶어 죽은 소년들의 원귀처럼 우는데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두 주먹뿐
수제비국 한 사발로 배를 채울 때
아낙은 신세 타령을 늘어놓고
우리는 미친놈처럼 자꾸 웃음이 나온다
신경림(申庚林) 「눈길」의 전문이다. 비유라고는 “바람은 (…) 굶어 죽은 소년들의 원귀처럼 우는데”라는 직유(直喩) 하나뿐인 이 서술문들도 ‘아무나 쓸 수 없는 좋은 시’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가?
이런 ‘쉬운’ 시일수록 그 물음에 답하기는 난감하다. 다만 이 시에 담긴 그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아마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합’에서의 탈락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시인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못지않게 어떤 언어의 사용을 억제했는지도 포함되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소회로 비평작업을 대신한다면, 「눈길」이 『창작과비평』 1970년 가을호에 「그날」 「파장(罷場)」 등과 함께 실린 것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이 시가 성취한 ‘재현’이 생생한 점도 있었고 재현된 내용의 ‘윤리적’ 함의도 가세했을 것이다. 동시에-그때는 물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누구나 쉽게 이해할 언어만을 사용해서 이런 감동을 준 것 자체가 ‘언어의 실험’이자 ‘문학의 실험’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향수」나 「눈길」처럼 읽기 쉬운 시와 “의미의 가독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전위적인 시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중간적 사례들이 있게 마련이다.21 또한 김언이 시에 대한 통념을 깨는 시라는 의미에서 ‘소설’을 쓰자고 했는데, ‘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통념상으로도 소설 장르에 속하면서 심지어 대중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작품도 ‘온몸’의 이행을 향한 경합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시인에게는 개인적 정치참여보다 작품의 정치성이 핵심문제고 작품은 사람들의 감성을 바꿈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정치참여를 수행한다는 말은 맞다. 그리고 이 점에서도 랑씨에르가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는 ‘치안’(la police, 영어의 police)에 해당하고 참된 의미의 ‘정치’(la politique, 영어의 politics)는 예술을 통해서건 다른 방법으로건 ‘감지 가능한 것의 배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22 그러나 ‘치안’-물론 이는 랑씨에르가 말하는 치안으로 이른바 제도권 정치만이 아닌 온갖 정치행위를 뜻한다-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정치’에의 관심이란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기능할 우려가 없지 않다. 랑씨에르 자신도 ‘정치’와 더불어 ‘정치적인 것’(le politique, 영어의 the political)이라는 낱말을 거의 동의어로 쓰다가도 후자를 치안과 정치의 접점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한다는데(PA, 용어해설 89면), 그렇기는 해도 근대국가의 나라살림을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지식인이기에 ‘치안’에 대한 개입을 덜 중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3세계라든가 분단체제의 변혁과정에 놓인 한국의 경우 치안의 영역이 극히 불안정하며 ‘감각적인 것의 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예로 ‘용산’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감지 가능한 것’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사태인 동시에 경찰권과 사법권 같은 치안행위에 약간의 개입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현장이 아닌가.
물론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작가가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험하고 작품으로는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고, 창작을 위해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일은 백해무익이기 쉽다. 이 대목에서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치열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자기 나름으로 치열했기에 곧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문학을 또다른 관념의 틀에 가두는 결과가 되기 쉽다. 특공대의 용맹은 존중하되 대중과 함께하는 좀더 다양한 공부와 사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__
- 자크 랑시에르 지음,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미학과 정치』(도서출판b 2008). 원저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2000)는 참조하지 못했고, 역자의 머리글 및 용어해설, 저자 인터뷰, 슬라보이 지젝의 후기 등이 함께 실린 영역본 The Politics of Aesthetics (tr. Gabriel Rockhill, Continuum 2004)를 주로 참고했다. 앞으로 이 책을 인용할 때 PA로 약칭하며 국역본의 면수도 병기한다. 다만 번역은 국역본을 참고하되 영역본을 근거로 상당부분 수정을 가했다.↩
- 다만 더욱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le sensible이 ‘감지된(및 감지 가능한) 것’을 뜻하며 ‘감각적인 것’의 통상적인 의미와는 구별됨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Esthétique를 ‘감성론’으로 옮기는 것 역시, aisthesis가 이성(logos)에 대비되는 감성(pathos)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을 통한 지각작용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꼭 맞는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진은영 자신이 그러듯이 본고에서도 이런 점들을 전제한 채 기존 번역본의 용어를 혼용하기도 했다.↩
- 내가 보기에 강계숙(姜桂淑) 「‘시의 정치성’을 말할 때 물어야 할 것들」(『문학과사회』 2009년 가을호)도 랑씨에르의 ‘자율성’ 개념을 일면적으로 이해한 예인 것 같다. 이 글은 싸르트르의 참여문학론과 랑씨에르의 미학의 정치성 논의를 대비하며 여러가지 섬세한 분별을 보여주고 생각거리를 제공하지만, 결국 “시는 예술로서 언제나 자율의 영역에 있”(388면)고 다만 ‘해석’을 통해 정치적 지평으로 옮겨질 뿐이라는 다소 거친-어떤 점에서는 시와 산문에 대한 싸르트르의 이분법적 인식을 계승하는-이분법으로 끝맺는다.↩
- 이 점은 랑씨에르가 『미학 안의 불편함』 같은 후속작업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그의 핵심 논지다(자크 랑시에르 지음, 주형일 옮김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원제 Malaise dans l’esthétique, 2004). 예컨대, “이 〔미학적-감성적〕 체제 안에서 예술은 그것이 동시에 비예술, 즉 예술이 아닌 다른 것인 한에서 예술”이며, “한마디로 예술의 미적〔-감성적〕 자율성은 그것의 타율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70면 및 113면; 영역본 Jacques Rancière,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Polity Press 2009, 36면 및 69면). 이 책에서의 인용문 역시 영역본을 참고해서 인용자가 손질했다.↩
- 신형철 「히스테리 라디오 채널-김언 시집 사용 설명서」, 김언 시집 『소설을 쓰자』 167면, 강조는 원문.↩
- 독자의 편의를 위해 전문을 인용한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사건이 되는 방식을 택하였다./얼굴이 공기를 감싸고 돈다. 윤곽은 피부를 헤집고 다닌다. 불이 붙는 순간//그 자리의 공기가 모조리 빨려 들어가는 입속에서 발견되는 사건들./기껏해야 몇 가지 단어들의 기괴한 조합. 가령/과도한 자신감에 시달리는 남자가 보는 새들의 울창한 숲소리.//한 문장씩 증가해 가는 연기를 따라서/뱀의 외모를 갖추어 가는 그의 사방이 이 자리에서 멈추고 저 자리에서 뛴다.//투명한 날짜를 지나서//그의 친구들이 온다. 그가 공기를,/가스라고 발음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터지지 않고/다만 타오른다.//불타는 두개골 속을 들여다보는 자의 자기 시선과 과대망상. 협소한 두개골 내부의 끓는 뇌는//사건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가만히 앉아서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그는 그 형태의 생각을 고집한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그는 그 자신의 고통을 앉은 자리에서 수행했다.//공기가 그를 도와주었다.”(『소설을 쓰자』 128~29면)↩
- Fredric Jameson, A Singular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Verso 2002), 160면.↩
- 마야꼽스끼(V. Mayakovsky) 등 러시아 사례들에 대한 훨씬 충실한 논의로는 이장욱 『혁명과 모더니즘-러시아의 시와 미학』(랜덤하우스중앙 2005) 참조. 이 책에서 저자의 비평적 맛썰미는 아흐마또바(A. Akhmatova), 빠스쩨르나끄(B. Pasternak), 브로드스끼(I. Brodsky) 등의 다양한 ‘서정시’를 아우를 만큼 포용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 버먼은 첫 장을 괴테의 『파우스트』론으로 시작하여 2장에서 맑스의 『공산당선언』을 논하고 ‘근대화’(modernization)를 논한 뒤에야 제3장의 보들레르론으로 나아간다. 뻬쩨르부르그의 모더니즘을 다룬 4장의 논의에는 20세기의 전위들 외에 뿌슈낀, 고골, 체르느이餮스끼, 도스또옙스끼 등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 책의 부제를 ‘근대성의 경험’이 아닌 ‘현대성의 경험’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부터가 의문이다. Marshall Berma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Verso 1983).↩
- ‘근대’에 대한 나 자신의 인식과 ‘모더니티’라는 영어의 번역에 따르는 혼란에 대해서는 졸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비 2006) 246~47면 참조.↩
- “Against this modern disorder, a rampart has been invented. This rampart is called modernism.” (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68면; 국역본 114면) 물론 이때 그가 비판하는 것은 모더니즘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그 자율성의 다른 이름인 타율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같은 면) 예술이념이다. 이 점에서도 그는 ‘이념으로서의 모더니즘’을 모더니스트들의 실제 활동과 구별한 제임슨과 일치하며(A Singular Modernity, Part II ‘Modernism as Ideology’), 루카치의 모더니즘 비판(Georg Lukács, The Meaning of Contemporary Realism, 1962, 제1장 ‘The Ideology of Modernism’)과의 접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 “There is no postmodern rupture.”(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 36면, 42면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옴; 국역본 70면 및 78면). 이 점에서는 제임슨과의 차이가 완연하다.↩
- 같은 책 32면(국역본 43면) 및 Jacques Rancière, The Flesh of Words: The Politics of Writing, tr. Charlotte Mandel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원저는 La chair des mots: Politiques de l’écriture, 1998), 제2부 제2장 ‘Balzac and the Island of the Book’; 『돈 끼호떼』에 대해서는 후자의 제2부 제1장 ‘The Body of the Letter: Bible, Epic, Novel’ 및 제3부 제1장 ‘Althusser, Don Quixote, and the Stage of the Text’ 참조.↩
- 랑씨에르의 littérarité(영어로는 literarity)가 ‘문학성’으로 번역되면서 ‘문학을 문학으로 성립시키는 고유의 예술적 본질’을 연상케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The Politics of Aesthetics 영역자의 용어해설(87면)이 강조하듯이 랑씨에르가 뜻하는 바는 거의 정반대다. 그것은 재현적 예술체제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 사이-문학에서라면 ‘순문예’와 ‘비문학’ 사이-의 차별과 위계질서를 허물고 문자로 된 온갖 생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민주적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단어를 ‘문자성’으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예술의 자율성’ 이념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오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졸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 창작과비평사 1985, 「리얼리즘에 관하여」, 372면.↩
- 같은 책의 「모더니즘 논의에 덧붙여」 중 ‘리얼리즘론에서의 “현실반영” 문제’(443~46면) 및 졸고 「로렌스와 재현 및 (가상)현실 문제」, 『안과밖』 1996년 하반기호 참조.↩
- 워즈워스가 대표하는 근대(현대?) 서정시의 ‘혁명’에 대해 랑씨에르가 The Flesh of Words 제1부 제1장에서 길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대의 시학에서 독자적인 위상이 없던 ‘서정시인의 자아’의 탄생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주로 관심을 돌리고, (광의의) 리얼리즘 문학의 성취로서 워즈워스의 시가 갖는 의미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양창렬과의 최근 인터뷰(양창렬 「자크 랑시에르 인터뷰-‘문학성’에서 ‘문학의 정치’까지」, 『문학과사회』 2009년 봄호)에서 그는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의 1800년 서문을 언급하며 “시가 비범한 인물의 정신상태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농부나 평범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것 역시 시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요”(445면)라고 하면서 역시 장르 간 위계의 붕괴라는 면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영국 시의 역사에서 워즈워스는 그에 앞서 셰익스피어 등 16, 17세기 시극작가들(및 존 던John Donne 같은 서정시인들)이 그러했고 20세기 초에 T. S. 엘리엇 등이 또 그러했듯이 시의 언어를 동시대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어에 가깝게 쇄신했다는 점이 ‘위계의 파괴’ 못지않게 중요하다(졸고 「시와 민중언어-워즈워스의 『서정담시집』 서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및 「현대 영시에 대한 주체적 접근의 한 시도-‘감수성의 분열’ 재론」,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솔 1991 참조).↩
- 앞에 참조한 PA 24면 및 양창렬과의 인터뷰 450~51면.↩
- 그는 이 체제를 poetic regim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의 poetic은 (국역본이 잘 번역했듯이) ‘시적’이 아니라 ‘시학적’이라는 뜻이며, 프랑스문학에서 유달리 위력을 발휘했던 고전주의적 시학을 염두에 둔 개념이 아닌가 한다.↩
- 물론 ‘감동’도 여러 질이며 ‘위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중의 현실순응을 부추기는 기능을 문제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프랑꼬 모레띠는-나로서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하피(Harpy: 상반신은 여자고 날개와 꼬리, 발톱은 새인데 그리스신화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감)에 물려 가는 영혼이 불가피한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비극적인 현실을 수용하게 하는 ‘현실원칙’을 대표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주장한다(Franco Moretti, Signs Taken for Wonders, tr. Susan Fischer et al., Verso 1983, 제1장 ‘The Soul and the Harpy: Reflections on the Aims and Methods of Literary Historiography’).↩
- 박형준(朴瑩浚)은 「우리 시대의 ‘시적인 것’, 그리고 기억」(『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호)에서 장석남(張錫南), 고형렬(高炯烈), 김사인(金思寅) 등을 그런 사례로 다룬 바 있다. 나 자신은 한 사람의 시세계 안에 초기 『만인보』의 누구나 쉽게 읽을 이야기 시와 선승의 난해한 언어를 망라하고 있는 고은(高銀)을 특별히 주목해왔다.↩
- 이런 구별은 이장욱이 원용한 샹딸 무페(Chantal Mouffe)의 ‘정치’(politics)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대비(이장욱, 300면 주6)와 상통한다. 즉 전자가 랑씨에르의 ‘치안’, 후자가 그의 ‘정치’에 해당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