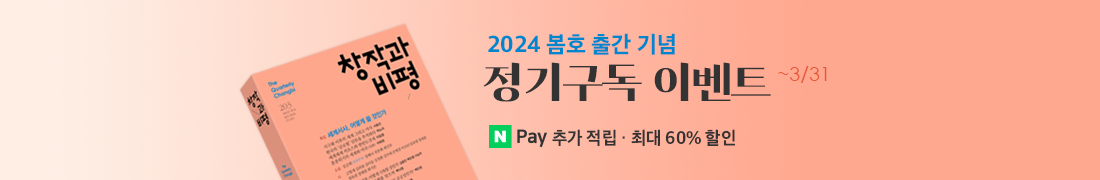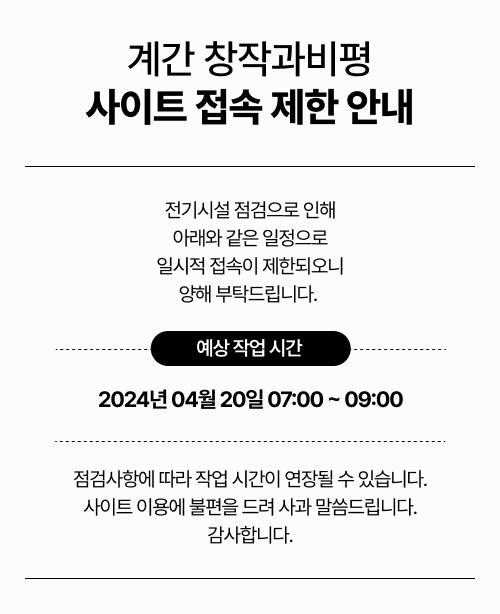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촌평 | ‘잔혹동시’ 논란을 보며_문화평
어깨나 몇번 쓰다듬어주면 될 것을
유병록 庾炳鹿
시인, 창비 어린이출판부 편집자 qudfhrdb@changbi.com
 상상해보자. 어린이 백일장이 열린다. 주어진 제목은 ‘거꾸로’다. 아이들이 부지런히 쓴 시를 제출하자, 시인 몇명이 모여앉아 심사를 한다. 엉성한 시도 있고 재미난 시도 있고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시도 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이 시에 장원을 줘야 할 것 같네요. 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죽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진다는 것. 다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심사위원이 시상식장에서 장원을 받은 아이에게 상장을 건네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아직 집에 안 돌아가시고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러면 정작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어린이 백일장이 열린다. 주어진 제목은 ‘거꾸로’다. 아이들이 부지런히 쓴 시를 제출하자, 시인 몇명이 모여앉아 심사를 한다. 엉성한 시도 있고 재미난 시도 있고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시도 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이 시에 장원을 줘야 할 것 같네요. 시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죽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진다는 것. 다른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심사위원이 시상식장에서 장원을 받은 아이에게 상장을 건네며 조심스레 묻는다. 그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아직 집에 안 돌아가시고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러면 정작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구체적인 병명까지 들어가며 아버지에 관한 시를 쓴 아이에게 물었더니 사실 아버지는 아주 건강했다는 것, 할머니의 장례식에 관한 시를 쓴 아이에게 물었더니 할머니는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는 것, 죽은 친구에 대해 물었더니 사실 그런 친구는 없었다는 것 등등. 이런 일을 경험한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차마 그러지 못했지만 상장을 도로 빼앗고 싶었다는 사람, 다음에 심사할 기회가 생기면 누가 아프거나 죽는 내용의 시는 뽑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사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느냐며 혀를 찼다는 사람, 웃고 말았다는 사람 등등.
이들의 허탈한 마음이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들이 시적 화자와 시를 쓴 이가 꼭 일치하진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지만, 아이들의 시를 읽으면서는 그 둘이 일치한다고 믿는 것을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아이를 탓할 것도 없다. 우리는 문학이 사실 아닌 진실을 추구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아이가 시를 쓰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가정하면서 시를 썼을까. 아이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가슴 저 아래에서 솟아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진다는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받을 까닭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에 관한 문학의 입장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되었는데, 현실에서는 종종 사실이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압도하기도 한다. 「학원 가기 싫은 날」(『솔로강아지』, 가문비 2015)이라는 시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다. 초등학생이 쓴 이 시는, 학원 가기 싫은 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반감을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함으로써 ‘잔혹동시’라는 이름으로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시작되자마자 사건은 간략하게 정리되어 유통되었다. 열살 아이가 잔혹한 내용의 시를 썼다는 것, 부모는 아이가 뛰어난 시를 썼다고 오해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였다는 것, 출판사는 수익을 위해 그 책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사실이다. 시에는 분명 잔혹한 구석이 있고, 부모는 아이의 시가 훌륭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며, 출판사는 많지는 않더라도 이익을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의 전부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변질되기까지 했다. 아이가 쓴 잔혹한 표현은 패륜으로, 아이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신이상으로, 아이의 책을 낸 출판사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비난, 비판, 욕설, 우려가 쏟아지며 마구 뒤섞였다. 시를 쓴 이와 그 부모가 곤란을 겪고 출판사가 해당 책을 회수해서 폐기하는 소동이 이어졌다.
다행히 소란은 가라앉았다. 사실에 관한, 심지어 변질된 사실에 대한 집착이 끝나자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소란의 크기에 비하면 왜소하기 짝이 없지만,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어린이의 문학적 표현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물론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와 그 시를 쓴 아이가 여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시가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를 읽은 부모들은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았을까. 무엇을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의 말을 좀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을 전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사실의 저울이 아니라 진실의 저울로 문학의 무게를 재야 한다는 말이 옳다면, 아이가 쓴 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다시, 죽은 어머니에 관한 시를 쓴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일을 고쳐 쓴 것이다. 짝꿍이었던 친구가 수업시간에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진다는 시를 썼다. 물론 친구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사실, 친구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다. 짐작건대, 친구는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이야기는 차마 쓰지 못하고 차라리 죽었다고 썼던 것 같다. 그 나이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시를 소리내어 읽으라고 한 다음 그 시를 교실 뒤편에 붙여두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선생님은 시를 읽고 난 친구의 어깨를 몇번 쓰다듬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문학을 제대로 이해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