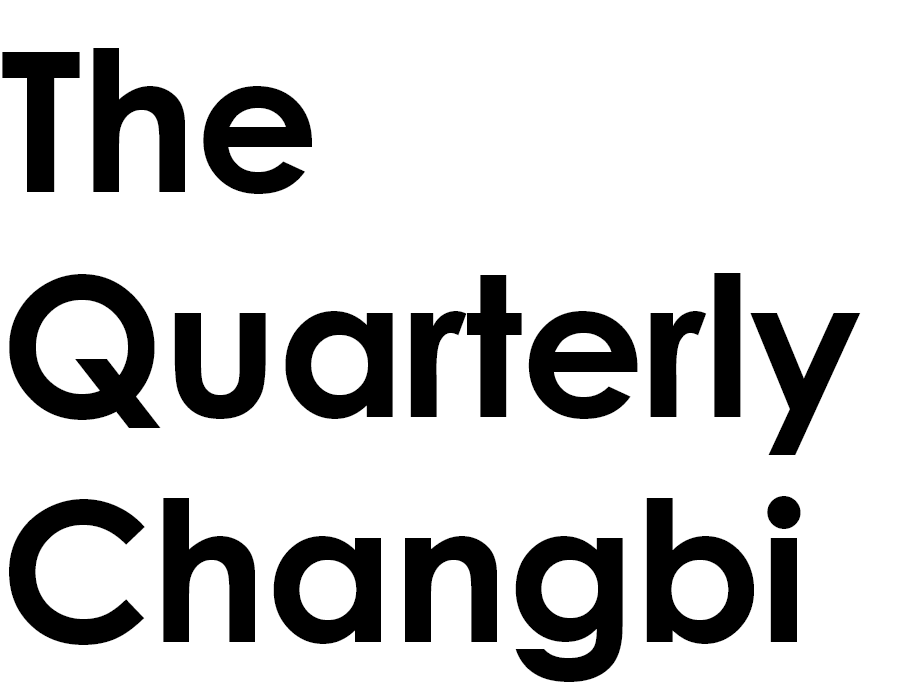창작과비평
- [2025 겨울] 통권 210호
-
‘K’라는 말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문화를 선도하는 자부심만이 아니라, 세계적 복합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계사적 전망을 만들어갈 책임감이 실린다. 이번호 특집은 우리 시의 성취 속에서 새세상 만들기의 노력을 확인하는바, 개성적인 창작란과 비평란, 작가조명 등과 더불어 문학이 지닌 선명한 힘과 깊이를 전한다. 기획연재 ‘K담론을 모색한다’는 『전태일평전』의 저자이자 굵직한 국가폭력 대응소송을 이끈 고 조영래의 실천과 사상을 생생히 보여주며, 극우현상을 다룬 대화와 현장은 서로 조응하는 흥미로운 읽을거리다. 배우 박정민의 산문과 주목할 신간들에 대한 촌평도 이채롭다.
책머리에
- 다시 만나야 할 세계 황정아 무료공개
특집_시적 창조와 세상 만들기
- 시와 역사의 협동적 창조 송종원 무료공개
- 역사의 몸, 장소의 시 신용목
- 희망할 자유 최선교
시
- 저 외 김뉘연
- 염소 외 김사인
- 똠과 Living In Korea32와 KJ 외 김현
- 없는 연습 외 박소란
- 경주 3 외 박연준
- 마르쎄유 외 손월언
- 겨울 체험 외 안미옥
- 벌레 이야기 외 오은경
- 여름 풀밭은 무성함이 자랑처럼 자라나고 외 임수현
- 압록에서 압록까지 외 정일근
- 모시조개 외 함민복
- 아일랜드 외 홍미자
소설
- 온통 부드러운 흰빛(장편연재 2) 백수린
- 엄종길 영감 김세희
- 천진한 사이 이선진
- 안평수옥 이주혜
- 모르는 사람 천운영
작가조명
- 장철문 시집 『식당 칸은 없다』 양경언 장철문 무료공개
대화
- 극우현상, 실체는 있는가 김내훈 이승원 이태호 황희두 무료공개
논단
- 조영래의 실천적 인권사상(K담론을 모색한다 ⑧) 박범순 무료공개
- 트럼프 2.0, 위기인가 기회인가 서재정
현장
- 대림동에서 안녕을 묻습니다 한채민 무료공개
산문
문학평론
-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서영인
- 평면화된 윤리를 교란하기 송현지
문학초점
- 그리움이 탄생하는 최초의 순간 남승원
- 느끼고 아는 존재들 권영빈
촌평
- 정수일 『문명교류학』 차병직 무료공개
- 이영은 『제국의 어린이들』 김민령 무료공개
- 권준희 『이주, 경계, 꿈』 박동찬
- 리영희재단 기획 『나와 리영희』 문예찬
- 정영권 『분단시대의 영화학』 김한상
- 최경봉 『한글 연대기』 오연경
- 강성현 외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박정훈
- 김용휘 『평민철학자 해월 최시형』 박맹수
- 임홍배 『독일 비평사 읽기』 이경진
- D. H. 로런스 『무지개』(전2권) 손영주 무료공개
만해문학상
- 제40회 만해문학상 발표 무료공개
백석문학상
- 제27회 백석문학상 발표 무료공개
독자의 목소리
창비주간논평
Changbi
Weekly
Commentary
-
- 최신글
- 반도체·AI 신드롬에 짓밟히는 노동과 생태
- 김상현 · 2026.02.10
- 반도체·AI 신드롬에 짓밟히는 노동과 생태 김상현 2026.02.10
- 국악을 모르는 정책이 국악을 바꾸려 한다: 단기성과에 길들여진 문화정책 윤중강 2026.02.03
- AI 시대의 출판, 새로운 협업이 필요하다 한기호 2026.01.27
- 언론개혁이라는 묵은 과제, 정보·소통 환경의 재구성이라는 새 과제 정준희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