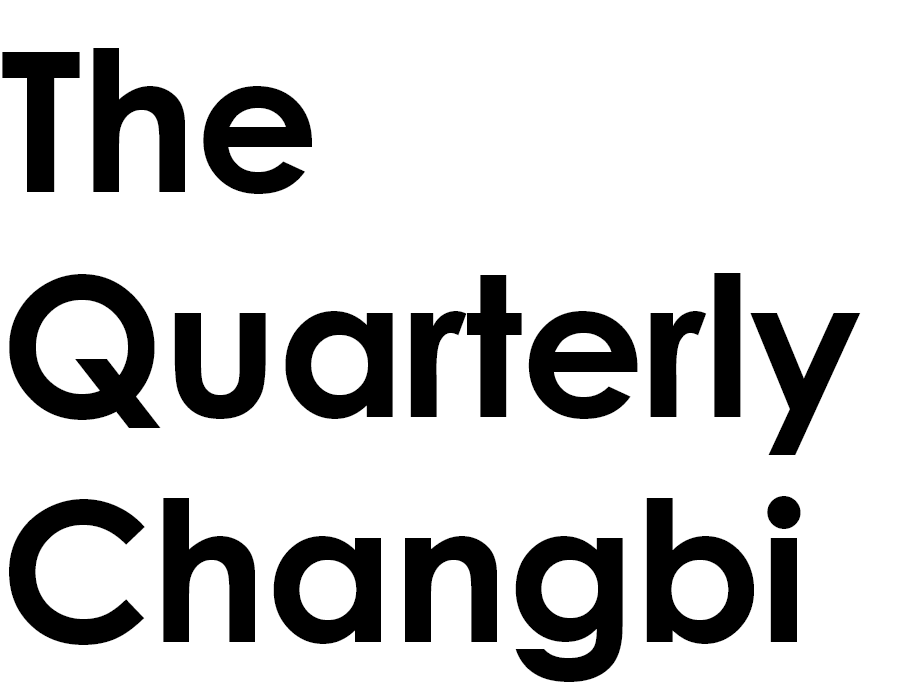창작과비평
- [2025 여름] 통권 208호
-
한국사회를 새롭게 할 또 한번의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큰 힘을 모아 변혁을 이룰 것인가. 이번호 특별대담은 ‘변혁적 중도’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과제를 살피고 2025년체제 만들기의 실천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해방 80주년을 맞아 분단 역사를 돌아보는 대화 역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변화를 촉구한다. 특집에서는 민주주의적 감정과 문학이 접속하는 자리에서 돋아나는 값진 희망을 전한다. 내란사태의 여진 속에서 그 긴요함을 절감하는 사법개혁 문제, 대안 경제사상의 원형인 고 박현채를 다룬 논단도 종요롭다. 빼어난 시·소설 신작과 평론은 여름의 활기를 깨운다.
책머리에
- 새로운 체제를 여는 간절한 마음 백영경 무료공개
특별대담
- 2025년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백낙청 이남주 무료공개
특집
- 역사적 감정의 존재양식과 『대온실 수리 보고서』 황정아 무료공개
- 미래를 짓는 애도의 서사 전기화 무료공개
- ‘니’와 인간의 공동체 황규관
대화
- 해방 80년으로 본 오늘의 한반도 김도민 문미라 허은 홍석률 무료공개
시
- 개구리 점프 외 김상혁
- 만나뽀끼 외 김소형
- 파묘 외 김수열
- 그러나 없습니다 외 유현아
- 고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외 유혜빈
- 아침 외 이문재
- 제너레이션 외 이민하
- 동지 외 전동균
- 쑥국 외 정우영
- 백목련 외 조성래
- 봄의 트릴로지 외 진수미
- 말의 힘으로 외 천양희
소설
- 우리와 우리 아닌 것 김혜진
- 창고 정리 문소이
-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문진영
- 여름의 시작 박민규
- 김춘영 최은미
논단
- 사법개혁, 법관의 지배를 넘어 시민의 사법으로 한상희 무료공개
- 박현채의 삶과 사상(K담론을 모색한다 ⑥) 이일영 무료공개
작가조명
- 백수린 소설집 『봄밤의 모든 것』 백수린 김나영
문학평론
- 말을 잃은 아버지들 하혁진
문학초점
- 소란한 고요와 고요한 소란 김태선
- 소설이 그리는 파열과 접속 민선혜
- 상속행위로서의 비평과 한국문학의 보람 오연경 무료공개
현장
- 불을 키운 건 누구인가 홍석환
- 시민이 만드는 국방정책 박석진
산문
- 정원에서 정원으로(내 삶을 돌본 것 ②) 안희연 무료공개
촌평
- 백영서·황정아 엮음 『문명전환의 한국사상』 나종석 무료공개
- 최원식 『잃어버린 배뱅이굿』 김인숙 무료공개
- 이경은 『국민을 버리는 나라』 소현숙
- 김형수 『대주교 윤공희』 김재형
- 이인혜 『씻는다는 것의 역사』 이도정
- 오드리 로드 『나는 당신의 자매입니다』 이주혜
- 거스 쿤 『사토시 테라피』 김용구
- 세라 핀스커 『언젠가 모든 것은 바다로 떨어진다』 설연지
- 김경식 『루카치 소설론 연구』 임홍배
독자의 목소리
창비주간논평
Changbi
Weekly
Commentary
-
- 최신글
- 파견법 27년, 더는 죽지 않게 하라
- 박정훈 · 2025.07.01
- 파견법 27년, 더는 죽지 않게 하라 박정훈 2025.07.01
- 성평등 민주주의, 돌봄의 사회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 김종미 2025.06.25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문제, 연속성과 새로움 정현곤 2025.06.17
- 할 일을 잘하는 이재명정부를 기대한다 이남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