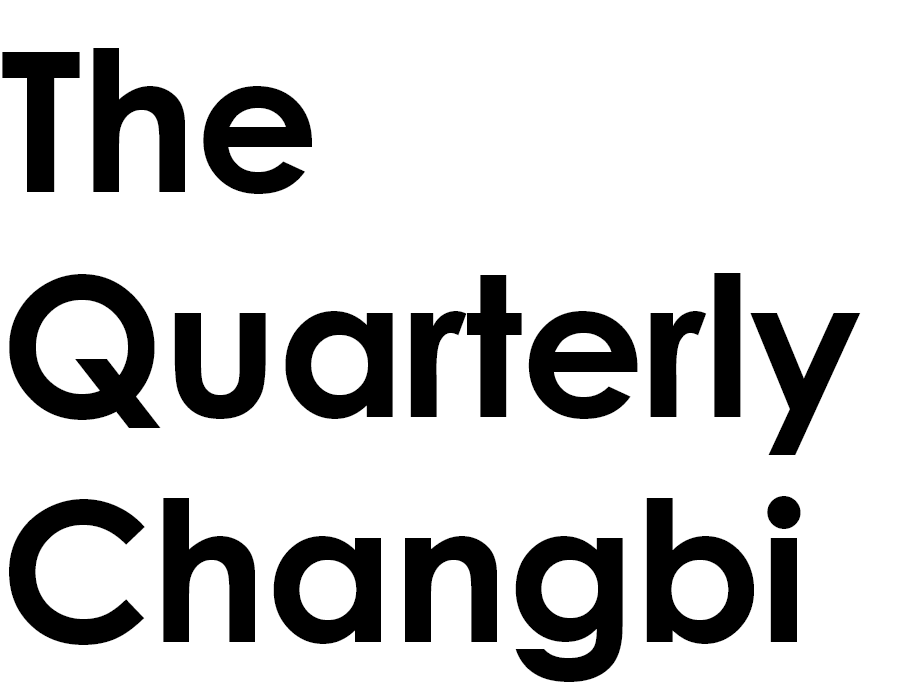창작과비평
- [2026 봄] 통권 211호
-
1966년 창간한 『창작과비평』이 60주년을 맞이했다. 한반도에서 축적된 인류 공동의 사상자원을 힘있게 모아내고 널리 공유하는 작업을 위해 본지는 앞으로 ‘K담론의 거점’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자 한다. 60주년 기념호인 이번호의 특집은 민주주의, 중도, 인간해방을 키워드로 K담론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지는 현재성과 보편성을 논한다. 60주년 기획으로 ‘한국문학과 K사상의 가능성’ 연재를 시작하며, 창작란에서는 신예시인선과 중편 특집을 일년간 이어갈 예정이다. 60주년의 성취에는 독자들이 보내주신 성원을 빼놓을 수 없다. 독자들 곁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책머리에
- 전환과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다짐 이남주 무료공개
특집_K담론의 성취와 미래
- 분단체제의 정치와 K민주주의 이남주 무료공개
- 중도의 재구성 백민정
- ‘인간해방의 논리’를 구현하는 K문화 박여선
시: 신예시인선
- 111근짜리 깃털 외 김보나
- 두나 외 김상희
- ASMR 1 외 우은주
- 내가 원하는 소설 외 유선혜
- 깃털 같은 사람 외 유수연
- 희곡지구 외 이용훈
- 움 외 이자켓
- 빛이 만나는 자리에 외 이하윤
- 습설 외 임주아
- 나주 외 조성래
- 종이의 친구 외 조온윤
- 자수 외 한여진
소설
- 그릇장 김애란
-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만나 전춘화
- 방울방울 정지아
- 걷는 사람(중편 특집) 전성태
작가 인터뷰
- 정이현 소설집 『노 피플 존』 성혜령 정이현 무료공개
대화
- 우리 시대의 현장 박누리 백영경 전준 주현우 무료공개
논단
- 초국적 극우연대와 한국 민주주의 유정애 무료공개
산문
문학평론
문학초점
-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 이미진
촌평
- 조효제 『불타는 지구에서 다르게 살 용기』 송종원 무료공개
- 오션 브엉 『기쁨의 황제』 윤수진
- 김중미 『엄마만 남은 김미자』 김유담 무료공개
- 구중서 『문화의 힘, 사람의 길』 김현수 무료공개
- 윤유경 『전국 언론 자랑』 이정훈
- 한형조 『두 개의 논어』 이영호
- 마이클 S. 최 『게임이론가, 제인 오스틴』 김명환
- 워릭 앤더슨 『서양과학은 없다』 노승미
대산대학문학상
- 시│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는 엑스트라다 외 오정주 무료공개
- 소설│Drop the ‘B’ 박승혁 무료공개
- 희곡│당신이 영영 모를 주문 반은지 무료공개
- 평론│감금과 죽음 사이의 틈 곽준서 무료공개
독자의 목소리
창비주간논평
Changbi
Weekly
Commentary
-
- 최신글
- 기후위기 시대, 트럼프보다 무서운 이윤의 논리
- 김선철 · 2026.03.03
- 기후위기 시대, 트럼프보다 무서운 이윤의 논리 김선철 2026.03.03
- 전환과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다짐 이남주 2026.02.24
- 반도체·AI 신드롬에 짓밟히는 노동과 생태 김상현 2026.02.10
- 국악을 모르는 정책이 국악을 바꾸려 한다: 단기성과에 길들여진 문화정책 윤중강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