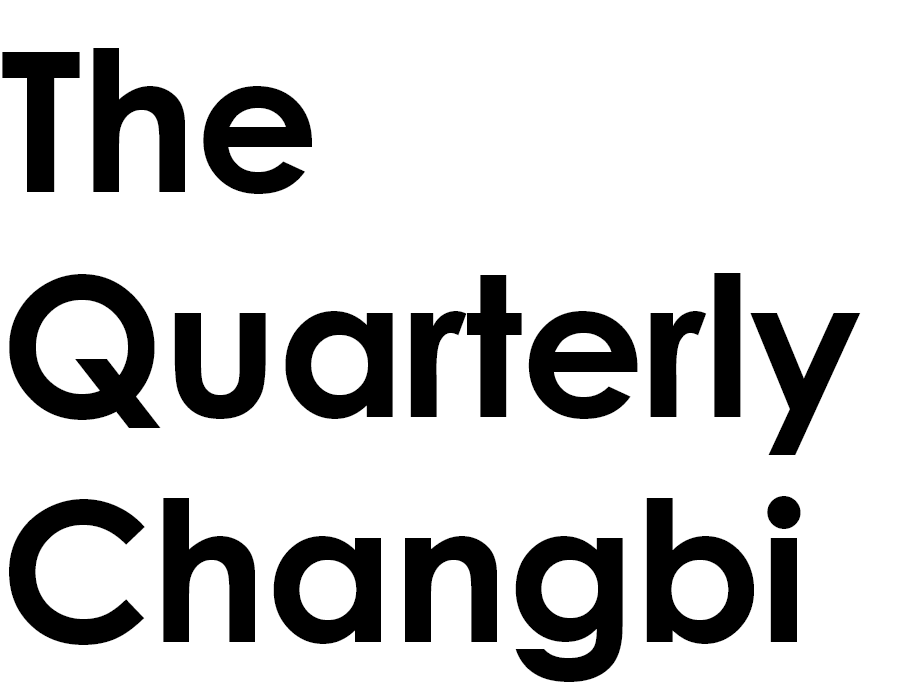- [2025 봄] 통권 207호
-
책머리에
- 빛의 서사로 써나갈 새로운 질서 백민정 무료공개
특집_K민주주의의 약진
-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백낙청 무료공개
- 연대로 확장된 광장과 민주주의 김소라 무료공개
- 한국의 보수는 왜 민주주의와 접속하지 못하는가 한홍구
- 김대중사상과 K민주주의(K담론을 모색한다 ⑤) 이남주 무료공개
시
- 걷는 사람 외 고재종
- 꼬뮌이 뭐예요? 외 권민경
- 12월 3일부터 외 김행숙
- 무등산 봄까치풀 외 손택수
- 농장 외 송희지
- 춘련 외 신미나
- 담금질 외 이실비
- 잠봉뵈르가 말하기를 외 이원
- 눈 내리는 오독 외 이현호
- 패배에 대하여 외 정호승
- 눈빛 보내기 외 조해주
- 숲과 숨 외 최현우
소설
- 물이 가는 곳 김유나
- 금빛 베드 러너 임솔아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임현
- 문제없는, 하루 황정은
대화
- 돌아온 트럼프, 다자주의로 돌파하자 김준형 김창수 최배근 무료공개
작가조명
- 안현미 시집 『미래의 하양』 김중일 무료공개
논단
- 내란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이동진
현장
- 수렁에 빠진 인권위, 다시 세워야 한다 홍성수 무료공개
문학평론
- ‘우리 것다운’ 문학을 향한 사랑과 헌신 유희석 무료공개
- 나를 쓰는 일은 어떻게 너를 쓰는 일이 되는가 김미정
문학초점
산문
- ‘수무드’가 가르쳐준 희망(내 삶을 돌본 것 ①) 조효제 무료공개
촌평
- 백낙청 외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 김용휘 무료공개
- 검찰연구모임 리셋 『검사의 탄생』 심인보 무료공개
- 이관후 『압축 소멸 사회』 조형근
- 석영중 『눈 뇌 문학』 류신
- 일란 파페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김요섭
- 이승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최지인
- 올가 토카르추크 『기묘한 이야기들』 김유태
대산대학문학상
- 시 | 명랑함을 가져보라고 외 이가인 무료공개
- 소설 | 검은 강 정이안 무료공개
- 희곡 | 0의 궤도 김채은 무료공개
- 평론 | 소음에서 고요로 향하는 존재의 발소리 최선재 무료공개
독자의 목소리
- 과거의 소년, 지금 오는 소년 외 무료공개
창비주간논평
Changbi
Weekly
Commentary
-
- 최신글
- 동동 안동산불, 7일간의 전쟁
- 안상학 · 2025.04.29
- 동동 안동산불, 7일간의 전쟁 안상학 2025.04.29
- 2025년 공적연금 개혁, 큰 변화를 위한 작은 한걸음 최영준 2025.04.22
- 새 정부는 ‘민생 목적 증세’에 나서라 오건호 2025.04.15
- 2025년 4월 4일,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양경언 2025.04.08